#모리스
Explore tagged Tumblr posts
Text
쟝 프랑소아 모리스 -모나코 (Jean Francois Maurice-28°A L'ombre)
youtube




News
하늘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나침반이자 동행자 입니다 친히 십자가를 메셨죠 비행기 말입니다
이노래를 바칩니다 여러분들을 올리비앙 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공항의 휴일 올리비앙의 수장이지요 호텔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행이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아멘 🙏
2 notes
·
View notes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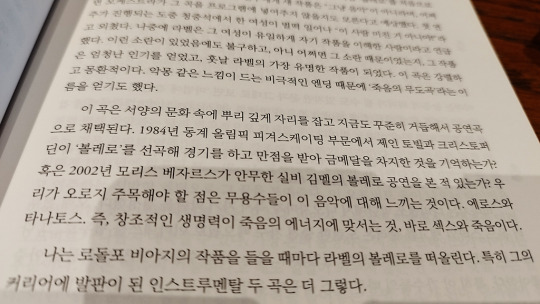
"볼레로와 로돌포 비아지"
'탱고스토리 : 우리를 춤추게 한 악단' 책 내용 중 로돌포 비아지(Rodolfo Biagi) 편에서 저자는 그의 음악을 들으면 '라벨 - 볼레로'가 떠오른다며 섹스와 죽음 운운해놨던데, 개인적으론 딱히 공감이 가진 않았다.
비아지 음악이 강박에 가까운 마르까또로 도배돼 있긴 하지만, 그게 볼레로와 뭔 상관인지 납득이 안간다는… 암튼 덕분에 볼레로에 맞춰 추는 두가지 안무를 유튜브로 감상.
우선 1984년 동계 올림픽에서 제인 토빌(Jayne Torvill)과 크리스토퍼 딘(Christopher Dean)의 피켜 스케이팅. 이거는 내가 거의 아는 게 없는 분야라 구글 검색하니 "전설적인 안무"로 엄청 유명하더만. 뒤늦게 유튜브 찾아서 본 소감 또한 문외한이 봐도 이우라가 느껴지긴 했다.
또 하나는 모리스 베자르스가 안무한 실비 길렘(Sylvie Guillem)의 볼레로 공연. (책에는 '실비 김멜'이라 써 있던데 오자인듯?) 이거는 나도 친숙하다. 어릴 때 TV에서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란 제목으로 외국 드라마를 방영했기 때문.
오리지널 필름에서 춤 줬던 댄서는 호르헤 돈(Jorge Donn)으로 1992년 45세에 에이즈로 사망.
유튜브 검색하면 이 분 외 여러 댄서가 같은 안무로 공연한 게 있다. 여성 댄서 중에는 마이야 플리세츠카야(Maya Plisetskaya)을 영상을 예전에 본 적 있다. (러시아가 아닌) 소련의 볼쇼이 극장 무용수였고 2015년에 심근경색으로 89세에 사망.
실비 김멜은 잘 몰랐다가 이 책땜에 찾아서 봄. 화질이 좋은 거로 미뤄 아마도 가장 근래에 속하는 공연이 아닐까 싶은…
youtube
youtube
2 notes
·
View notes
Video
youtube
모리스 라벨 - 볼레로 | 알론드라 데 라 파라 | WDR 심포니 오케스트라
0 notes
Text
Lothringen! 로트링겐!
Jean-Marie Straub & Danièle Huillet 장마리 스트로브 & 다니엘 위예
Germany, France | 1994 | Color | Sound | 35mm (digital projection) | 22’


PROGRAM Α: Opening Films 개막
2024 Oct 25 (Fri), 18:00
Lothringen is the German pronunciation of the French region Lorraine, a historically contested area between France and Germany, part of the Alsace-Lorraine region. After France lost the Franco-Prussian War, Lorraine was ceded to Germany, forcing many of its people into a life of exile and uncertainty. Jean-Marie Straub, who was born in Metz, Lorraine, (and Danièle Huillet, originally from Paris,) adapted Maurice Barrès' novel Colette Baudoche, which tells the story of the tragedies of this region. The film blends narration over idyllic rural landscapes, creating a powerful sense of history embedded in the land itself. Their cinematic approach becomes both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central authority and a gesture of healing or liberation for those who have suffered. (Il-hwan) *Premiered in French cinemas in 1997 alongside VON HEUTE AUF MORGEN.
프랑스와 독일 사이 주요 분쟁지였던 알자스-로렌에서 로렌의 독어 독음이 “로트링겐”이다. 로렌 지역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함에 따라 독일로 할양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실향과 표류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로렌 지역의 메츠 출생인 장-마리 스트로브는 (파리 출생인 다니엘 위예와 함께) 로렌의 비극을 다룬 모리스 바레즈의 소설, 『콜레트 보도슈』(1909)를 영화화했다. 목가적인 로렌 마을의 풍경 위로 들려오는 나래이션은 시각을 초월하여 대지 내부에 퇴적된 역사의 감각을 일깨운다. 이러한 영화적 행위는 중앙 권력에 대한 저항이자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위무 혹은 해방이다. (일환)
*1997년에 <오늘부터 내일까지>(1997)와 함께 프랑스 내 극장 개봉되었다.
About Jean-Marie Straub & Danièle Huillet
Jean-Marie Straub and Danièle Huillet are a legendary film director duo often regarded as icons of modern cinema. Their films, spanning France, Germany, Italy, and beyond, have left an indelible mark on film history, with their influence continuing to this day. (Il-hwan)
장-마리 스트로브와 다니엘 위예는 모던 시네마의 전설로 회자되는 부부 감독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오가며 영화를 만들었고, 그 정신이 불멸하여 현시점까지도 영화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환)
Contact: [email protected]
0 notes
Text

(사진 출처: https://www.aladin.co.kr/m/mproduct.aspx?ItemId=34529940 )
<들어가는 글>
역시 주체와 자유가 문제다. 주체를 결코 실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 관점이고, 자유는 구체적인 현실 상황을 벗어난 상태에서 운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공통적이다. 문제는 자유로운 현실 주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 자유로운 주체가 추구하는 삶의 뿌리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느냐이다. 우주에서부터 사회역사를 거쳐 심층적 자아를 향한 사유의 궤적이 다시 순환해 우주로 ���아갈 수밖에 없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적 사유를 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결국 긴급한 실천적 사유의 영역은 사회역사적인 현실 특히 정치적인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p13)
<장 폴 사르트르, 타자를 발견하다_변광배> ***
18, 9
사르트르는 '타자'를 '나'의 '대타존재'étre-pour-autrui'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대타존재의 문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합니다. 우선 '타자'란 어떤 존재인가, 즉 타자의 존재 증명의 문제와 둘째로 '나'와 '타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 즉 '나'와 '타자'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나는 나의 존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필요로 한다. '대자'는 '대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인간과 즉자존재와의 존재 관계를 그 전체 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책의 앞의 장들에서 소묘한 기술들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아주 다른 의미로 놀라운 두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타자의 존재 문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타자의 존재에 대한 나의 '존재' 관계의 문제이다. (사르트르, 《존재와 무1》, 390쪽)' (p22)
사르트르는 대타존재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해 간단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타자란 나를 바라보는 자"라는 정의가 그것입니 다. 이렇듯 사르트르는 타자를 '시선regard, 視線' 개념을 통해 명쾌하고도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p22)
24-5-6
앞에서 시선은 '힘'이며, 그것도 그 끝에 와 닿는 모든 것을 객체로 사로잡아버리는 힘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사르트르의 타자론에서 '���'와 '타자'는 조화롭고 평화스러운 관계 대신 항상 갈등, 투쟁의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르트르에게서 모든 인간은 '주체'의 자격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나도 주체이고, 타자도 주체입니다. 다시 말해 나도 타자도 모두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자신을 기투, se projeter' 하면서, 즉 '실존'하면서 각자의 '본질essence'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타자는 그의 시선을 통해 출현하자마자 나의 이러한 기투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선을 통해 나를 객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르트르의 사유에서 나와 타자는 항상 각자의 시선을 통해 상대를 객체화시키려고 하면서 주체의 위치에 있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각자의 시선이 한 번 폭발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서로에게 위험한 폭발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p29)
•기투 신의 부재를 자신의 학문적 가정으로 삼고 있는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태어나면서 아무런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백지 상태'로 있다. 이 상태에서 인간 존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창조해나가면서, 다시 말해 '실존'해나가면서 자신의 본질을 갖게 된다. 이때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을 사르트르는 '기투'로 표현한다. 기투는 프랑스어 단어 'projet'에 해당한다. 이 단어에서 'jet'는 '나아감', '분사' 등의 의미를, 'pro'는 '앞으로'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p29)
34 35-6, 7--->38--->41 , 42 (45) (47) (48)
<목과 살, 그리고 세계의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_정지은> ***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정명환 외, 민음사, 2004) (p51)
[눈과 정신](국역본은 [눈과 마음], 김정아 옮김, 마음산책, 2008) (p52)
54
'나는 할 수 있다'는 퐁티의 육화된 주체는, 나의 고유한 신체의 활동이 사유보다 앞서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체의 활동이 반사나 기계 활동이 아닌 바로 이 '나'의 고유한 활동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활동성, 대상과 세계가 마주하는 나의 신체의 자발적 운동에 의해 규정되는 그 주체가 '나는 할 수 있다'의 주체인 것입니다. 사유하는 주체에게 의지와 결정 (결심)이 문제가 된다면, 메를로-퐁티의 할 수 있는 주체에게는 동기와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동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죠. 가령 저기 산이 있어요. 저 산을 보는 순간 내가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산은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내 행동의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것이죠. 정신이 아니라 나의 신체가 세계 속에 나를 던지는 바로 그 순간 대상이 내게 동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의지나 결정이 오래 걸리는 반면 동기와 행동은 즉시 일어납니다. (p55)
다시 고유한 신체로 돌아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체는 항구적인 현존입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어떤 것이지요. 나에게 나의 신체가 현존한다는 것은 내가 곧 나의 신체라는 말입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내 신체는 내 소유물이 됐어요. 내가 내 신체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도 더 명석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이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성형, 장기기증 등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비극이 초래되지요. 이에 메를로-퐁티는, 신체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신체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며 반기를 듭니다. 신체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늘 나와 같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항구적인 현존으로서의 몸의 지각은 외적 지각과 동시에 일어나지만 구분될 수 있으며, 오히려 외적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p57)
59 62-3
게다가 메를로-퐁티는 주체성은 곧 시간성이며, 주체의 관념에서 출발해서 시간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시간성을 경유해서 주체성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간성에 근거해 '상황'은 사르트르와 다른 정의를 낳습니다. 요컨대 상황은 주체의 애매성의 표현입니다. (…) 다시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의 자유 개념을 비교해봐요. 간단히 말해서 사르트르의 자유는 의지와 결정이에요. 반면 메를로-퐁티에게 자유는 동기와 행동이지요.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육화된 주체, 나의 고유한 신체로서의 주체인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동기에 대해서 내 앞에 산이 있을 때 나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산을 오르려는 동기가 소용이 있다고 봅니다. 메를로-퐁티는 거꾸로 보죠. 저 산이 올라야 하는 산이라는 것은 이미 그 산이 내 행동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산은 이미 나의 행동의 동기인 것입니다. (p64)
65
우리는 여기서 메를로-퐁티가 사르트르와 정반대되는 자리에 주체성을 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주체는 무화하는 주체입니다. 메를로-퐁티의 주체는 무를 출현시킵니다. 이것은 세계를 계속 생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반면 사르트르는 세계를 계속 없앱니다. 사르트르의 주체는 자신과 자신을 결정했던 세계를 무화시키면서, 자신의 존재를 '존재했었음'이라는 과거 속에 밀어 넣으면서 그 자신이 사건이 됩니다. 즉 세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변합니다. 메를로-퐁티는 사르트르의 주체가 우연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메를로-퐁티의 주체에게 사건은 그 자신의 출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의 출현으로서 경험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늘 임박한imminent 식으로, 다시 말해 출현하자마자 사라지는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의 현재의 장에서 체험되는 임박함이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존재, 무의 출현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라는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기투와 기투 사이의 균열, 혹은 빈공간입니다. (p66-67)
부연하자면, 메를로-퐁티는 이 '나' 안에 나의 의식이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며, 이것은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가령 나는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혹은 타인이 내 앞에 있는 대상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비록 그것이 나의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르트르에게는 나의 세계 안에 타인이 의식적 존재로 출현하는 순간, 나는 물론이고 나의 세계가 마치 수챗구멍으로 빠져 달아나버리죠.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타인이 있더라도 나의 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나의 신체와 타인의 신체가 관계하는 공동의 세계, 지각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p68)
자신의 삶을 미래로 가져다 놓는 결정은 자유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며, 자유가 발견되는 곳은 외부 세계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각 개인의 실존에서 자유의 행위가 없다면, 각 개인이 오로지 자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만족한다면 역사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개인적 실존에서 자유에 의한 결단이 집단적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또한 어떻게 역사가 구성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메를로-퐁티는 '사회적인 social'을 각 개인들의 실존에서의 가능성의 영역, 내가 중심이 되는 유아론적 세계 너머의 영역에 놓습니다. 외양상으로 이 영역은 사건처럼 출현합니다. 그렇지만 사건은 "모든 개인적인 ��정 이전에 사회적인 공실존과 on 안에서 세공되는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 [기투] 입니다."(《지각의 현상학>, 670쪽, 번역 수정) (p71)
메를로-퐁티에게 자유는 타인들과 공존한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해요. 이것은 타인을 압제하고 타인을 나의 세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지각적 세계 속에서 나의 실존의 형식이 타인의 실존의 형식에 의해 촉발되어 나를 넘어섬으로써 공통의 세계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각 의식은 다른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거나 자신을 상실하며", "사회적인 것의 완성은 상호주체성, 개인들 간의 생생한 관계와 긴장"(Merleau-Ponty, Sens et non-sens, Gallimard, 1996, p. 110) 속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을 포기함으로써 보편적인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타자들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만들면서, 상황들이 생생한 긴장 상태 속에서 서로 이해되게 하는 저 신비한 친화성 덕분에 보편적인 것에 도달합니다." (Sens et non-sens, p. 113) (p72)
73, 4 74-5 79, (81)
<엠마뉘엘 레비나스, 향유에서 욕망으로_김상록>
레비나스가 남긴 대담들 중 아마도 가장 빼어난 것일 필립 네모와의 대담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레비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별을 겪었을 때, 폭력적 장면을 목격했을 때, 시간의 단조로움을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되었을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받은 상처나 그때부터 헤매는 암중모색은 도무지 형언할 길이 없는 것들이라고 덧붙이면서, 이 말할 수 없는 충격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사유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독서를 통해서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레비나스가 추천하는 책들은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여러 국민문학들과 무엇보다 성경입니다. 이런 책들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증언함으로써 현실 속에 참된 삶이 부재함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증언을 두툼한 글로 물질화함으로써 참된 삶이 유토피아에나 있을 법한 환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습니다. 독서는 삶의 우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형이상학적 도약이며 현실을 굽어보게 해주는 초월적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현실의 염려라는 벌레에 갉아 먹히기 십상이죠. 하지만 인간의 삶이 의미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들을 읽으면서 욕망은 그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구체화될 길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p85)
(86)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레비나스는 모두 존재라는 벽에 갇혀 있다는 존재론적 사실에서 비롯되는 존재의 고통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존재와의 이런 감응을 통해 제기되는 존재 물음 (존재 또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철학의 원原사태로 본다는 점에서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피상적 공통점 이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숨어 있어요. 하이데거는 존재가 내 자유를 제한한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반면, 레비나스는 내 자유가 설령 무한정 증대된다 할지라도 결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요.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데거가 한탄스러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고자 하는 내가 역사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포기해야 하는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의 토대는 내 자신이 놓은 것이 아닐 뿐더러, 즉 선택권 없이 태어난 삶일 뿐더러, 탄생 이후에 주어지는 선택도 하나를 선택함과 동시에 배제되는 다른 가능성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원통함에서 출발하는 하이데거는, 내 삶에 가해진 한계를 넘어서기를 갈구합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의 근본 바람(욕망)은 자기 존재의 한계를 무한히 초월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제한의 자유를 갈망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는 어떤 숨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청년 시절부터 바로 이 전제가 서양 존재론 전통 자체의 밑바탕을 이룬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 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전제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존재는 덜 것도 더할 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이데거의 한恨과 불안은 내 존재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지, 레비나스처럼 존재 자체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만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정이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p88-89)
반면 레비나스는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열강들의 전체주의적 패권 투쟁으로 점철된 국제정세) 앞에서 끔찍한 공포를 느낍니다. 이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처럼 자유의 관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 서기 때문입니다. 각 존재자들(이 경우, 각 민족들)이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서로를 불러내는 투쟁의 방식으로 존재가 운동할 때,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처럼 그 속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의지를 품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영웅적 투쟁의 부질없음을 설파합니다. 하이데거가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열강의 입장에 선다면, 레비나스는 그런 열강들이 휘두르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희생되는 개인의 편에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p90)
타자를 공략하여 동일자로 흡수하는 전체주의 운동인 나치 체제 속에 있는 한, 내가 보다 더 유능하다는 장점이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의 불안과 고통을 전혀 덜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보편적 의미를 띤 사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동일자의 자기 회귀라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존재의 지평 속에 있는 한, 내가 더 많은 가능성을 지녔다는 우월성이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고통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존재의 고통은 하이데거가 생각하듯 내가 가진 자유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니다. 인생에 대한 불만의 궁극적 뿌리는 불우한 가정환경,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직업, 가난함 등 잡다한 제약들 (존재자 차원의 제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존재의 근본 고통은 오히려 내가 나라는 존재로 있다는 사실(존재 차원의 제약)에서 오는 것입니다. 존재의 고통은 하이데거가 생각하듯 내 존재에 가해진 한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존재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온다는 레비나스의 말을 이제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도무지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출구가 없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생로병사 인생고의 가장 깊은 뿌리가 있다는 말이죠. 이에 상응해서 인간의 근본 바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와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더 나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초월의 욕구가 아닙니다. 아예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탈의 욕구, 그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자기를 초탈하여 전혀 다른 곳으로 가려는 욕구, 절대 타자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근본 욕망인 것입니다. (p91)
92
세계 내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세속적 초월의 욕구를 인간의 근본 욕망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관건은 자기 존재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묶여 있다는 존재론적 제약은 세계-내-역량 (세속적 능력)이 더 커지면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로부터 해방되려는 욕망 앞에서 세속적 성공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론적 차원의 욕망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 무한에 대하여 존재자 차원의 한계를 얼마만큼 극복했느냐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무한에 대하여 유한한 크기가 영이나 다름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p93)
(94)
존재의 고통이 존재 물음을 제기하는 형이상학적 시련이라면, 하이데거와 레비나스 모두 이 시련을 권태와 같은 일상의 현상들 속에서 체험토록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철학자 모두에게서 존재 물음의 궁극적 차원은 인류의 역사 전체와 관련됩니다. 이 때 물음으로서 제기되는 존재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전개되는 역사의 운동을 뜻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의미의 존재에 대해서 두 철학자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존재 (즉, 역사)의 자기 동일화 운동이 개별 존재자들을 노리개 삼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개별자를 지켜 내려고 하는 반면, 하이데거는 개별자들에게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존재의 운동에 영웅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이데거는 존재에 내던져진 존재자에게 이 존재의 운명을 적극 인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레비나스는 그런 운명을 강제하는 존재에 대해 존재자가 근본적으로 단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체성의 이념을 거부하고, 존재자를 존재에 예속시키는 존재론적 차이를 역설하는 하이데거에 맞서, 레비나스는 존재로부터 존재자를 독립시키고 개별 존재자의 주체성과 내면성을 옹호하는 존재론적 분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p95)
97-8 99 100
존재를 정복한다는 것은 나의 동일성을 위협하는 존재(자연)의 타자성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성의 빛을 통해 주체의 시각에 주어지는 존재는 위협적인 타자성을 잃고 대상으로 분절됨으로써 주체에 의해 원격 조작이 가능한 객체성 (대상성 또는 객관성)의 틀 속에 갇힙니다. 이를 통해 동일자(주체)는 존재를 자기에게 복속시켜 ���신의 소유물로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존재(자연)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건설한 세계는 자기 밀실(집)에서 누리는 향유의 행복을 보다 굳건히 지키기 위해 이 밀실을 끝없이 확장해 온 결과였습니다. 그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거침없이 발휘할 수 있는 주권적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확장된 밀실을 목표로 구축된 세계의 안전은 다름 아닌 이 세계 자체의 논리에 의해 결정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속의 개인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고 자기 밀실의 행복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이 세계-내-존재로서 육체를 가진 나는 언제나 이미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타인들 사이의 관계망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는 언제나 이미 타인들에 의해 소외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운명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타자성(이번에는 자연의 타자성이 아니라 타인의 타자성)은 각 개인을 자기 존재의 벽적인 물질성 속에 다시 한 번 가두는 것입니다. 이런 소외와 예속 상태가 극에 달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p101-102)
104, 5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홉스라면 그것은 직접적 충돌 (전쟁 상태)이 야기할 위험을 피하고자 충동을 연기하는 계산적 합리성에서 나온다고 말할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다르게 봅니다. 전쟁과 평화의 차이는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합리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에게 근원적인 욕망은 자기 보존 충동이 아니라 자기를 초탈하여 타자로 나아가려는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초탈과 타자 지향의 욕망은 일단 주체에 의해 거부됩니다. 평온한 균형 상태에 우선 대개 머물고자 하는 주체에게 타자를 향한 욕망은 일단 놓여나고만 싶은 불쾌감으로 체험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존재의 고통이 바로 여기서 연원하는 것이죠. 이런 주체는 자신의 평온한 균형 상태를 교란하는 타자의 출현에 대해 즉각 파괴적 생명력을 방출하거나(전쟁), 이를 참고 평화적 교류를 하더라도 작용-반작용이라는 상호성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등가교환에 입각한 불안정한 평화). 이런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물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이 사물화 현상의 존재론적 근원은 그러므로 절대적 휴식, 절대적 비활성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관성적 충동에 있습니다. 이 충동이 따르는 법칙을 레비나스는 '존재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p106)
107-8
그러나 레비나스가 우리에게 천거하는 삶의 궁극적 형태는 이런 메시아적 자기희생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리라, 오직 나만이 그런 책임을 맡을 수 있으리라, 이런 불굴의 메시아적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닥치면 결국 거기에 삼켜지고 말 운명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적 의지는 자기를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유한자가 무한 타자의 현전을 홀로 감당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적 희생을 불사하려는 의지는 자기에 대한 남성적 고집으로 응집되어 있는 까닭에 스스로는 자기 포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유한성을 인수한 여성의 인도 아��� 에로스의 밤을 보내면서 메시아적 주체는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강철같이 단련된 남성적 의지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와 다른 자기 속에서 부활합니다. 에로스의 밤을 통해 도래할 새로운 타자(아이)를 통한 부활입니다. 출산을 통한 부성, 아버지 되기가 그것입니다. 미래의 아이는 내가 성적 사랑에 빠져 무한 책임을 방기한 것을 용서해 줄 존재입니다. 내가 세계에 선사한 아이는 그 자체가 또 선사인 까닭입니다. (p109) 엠마뉘엘
110 (111)
<전체성과 무한>에서처럼 악의를 가진 타인에 의해 고문 받는 죽음의 불안이 또다시 자아를 엄습합니다. 자기 존재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궁지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 생사가 걸린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가장 탁월한 형이상학적 물음입니다. 그러나 레비나스가 그런 물음으로 간주하는 것은, 라이프니츠에서 셸링을 거쳐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전통 형이상학의 물음이었던 '존재는 있고 왜 무는 없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는 정당한가?'라는 물음입니다. 나를 고문하는 타인은 내게 제기되는 형이상학적 물음 자체인 것입니다. 이 물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할 때, 자아의 자기중심적 폐색이 무너지면서 무한 타자를 지향하는 자기로의 전향이 이루어집니다. 여태껏 고통스럽기만 했던 사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회귀하지 않고 무한 타자를 향해 가는 초탈의 경지에 들어서는 순간이죠. 기존의 자기가 익명적이거나 성적인 물질성과 통하는 감성을 지녔고 남성적 로고스의 부름에 응답하여 존재를 정복·향유하는 이성을 갖춘 자기라면, 그 아래 억눌려 있다가 이제야 드러나는 새로운 자기는 모성적인 물질성과 부성적인 영성에 각각 감응하는 감성과 이성을 겸비한 자기입니다. 이런 자기가 무한 타자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분출할 수 있는 참된 자기입니다. 마치 내가 받고 자란 부모의 사랑을 고스란히 타인에게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죽은 듯 있다가 되살아난 듯이 말입니다. (p112)
115 116-7 (118)
<모리스 블랑쇼의 중성과 글쓰기, 역동적 파노라마_김성하> *
크리스토프 비덩Christophe Bident <모리스 블랑쇼: 보이지 않는 동반자Maurice Blanchot: partenaire invisible> (p121)
결국 블랑쇼의 글은 삶과 죽음, 죽음과 사유, 사유와 삶을 통하여 그 사이에 놓인 모든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나약하면서 나약하지 않은, 강인하지 않으면서도 강인한 이런 상태가 바로 블랑쇼가 언급하는 철학적 주제 혹은 사상적 주제 중 하나인 '중성 le neutre'을 의미합니다. 이 중성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애매모호한"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며 동시에 저것인" 공통분모를 의미하지도 않지요. 즉, 블랑쇼가 말하는 중성은 검은색과 흰색을 놓고, 그 둘의 경계에 있는 회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은색 물감과 흰색 물감을 섞을 때, 팔레트 위에 나타나는 검은색, 흰색, 회색의 다양한 파노라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코 무기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역설적이며 모순되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솟아나는 역동성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 속에서 솟아나는 역동적인 중성을 상상해야 합니다. 블랑쇼를 읽으며 자주 만나게 되는 '죽음la mort', '고독la solitude', '낯섦 l'étrangeté', '바깥le dehors', '불가능 l'impossible', '밤lanuit', '불안'angoisse', '부재 혹은 결여'absence', '재난le désastre', '우회ledétour', '중단'interruption', '어둠l'obscur', '타자'autre', '부분 혹은 단편 le fragmentaire' 등도 이런 역동성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결코 부정적, 소극적 혹은 수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p124)
블랑쇼는 '사유하다 혹은 생각하다 penser'라는 것을 '철학하다 philosopher'라는 것과 구별하면서, 이런 사유의 주제들이 갖는 역동성을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주제들을 개념화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개념화라는 것은 폐쇄와 정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과 관련하여 개념화라는 철학적 작업이 아닌, 글쓰기라는 작업을 통하여 사유의 과정을, 즉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블랑쇼를 논리 정연한 언어에 기반을 두고 분명하고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는 철학자라고 명명하기보다는 경험을 사유하고 혹은 생각하며, 또 사유와 생각을 경험하며, 그 과정을 글로 보여주는 저자, 즉 글쓴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한지도 모릅니다. (p125)
127
이렇듯 블랑쇼는 이미 확립된 지식, 혹은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l'enseignement'과 '제도 l'institution'로 이해되는 기존의 철학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 블랑쇼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지니고 있는 물음의 형태로서 전통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불랑쇼는 철학보다는 문학과 예술이 '생각하다'는 행위에 더 가깝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따라서 블랑쇼를 철학자로 보고, 철학 개념으로 그의 사유와 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블랑쇼를 다소 왜곡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블랑쇼를 이해하면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없는 물음의 연속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 물음의 연속은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그 생각의 결과와 목적과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 결과, 목적, 정답이 있다면, 그 결과는 끝이 아닌 무한한 시작으로서의 결과일 것이며, 목적은 이 무한한 시작의 여정이 그 목적이며, 정답은 그 무한한 여정을 통하여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답일 것입니다. (p130)
블랑쇼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다시 말해 삶의 경험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살아 있는 사유la pensée, 즉 경험된 사유 혹은 사유의 경험이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유란 어떤 것이며,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경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의식 la conscience'과 '반성 la réflexion', 특히 의식의 주체인 '나leje'에 의해 구성되고 추상화되는 철학적 개념과 구별되는 것일까요? 우선 블랑쇼가 '살아 있는 사유'라는 표현 혹은 개념을 정의하거나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 혹은 반성이라는 철학적 명제와 구별하면서 "사유하다 혹은 생각하다pens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데카르트�� 코기토cogito 와도 구별되며, 그 이후의 철학, 특히 칸트, 헤겔을 거쳐 체계화되는 생각하는 주체 혹은 사유하는 자아와도 구별되는 것이지요. 즉 블랑쇼는 의식과 반성이 아닌 경험된 사유 혹은 사유의 경험을 통하여 철학, 문학 등에서 인정되고 거론되었던 기존의 모든 (혹은 가능한 모든, 혹은 몇몇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개념과 가치를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또 그 개념과 가치들이 담보하고 있었던 모든 가능한 모든 혹은 몇몇) 명확한 대답과 확신들에 물음표를 찍으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랑쇼에게 있어서 '사유하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그가 '사유'라는 개념을 정의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 블랑쇼는 철학, 문학 등에서 얘기되고 있는 주제들을 끊임없이 묻고 또 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 명확하고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거나 찾지 않을 뿐 아니라, 불변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는 물음을 통하여 해답 자체가 없다고 부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음에 따른 해답은 또 다른 물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남아 있게 되며, 다시 말해 끝으로서의 답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서의 답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블랑쇼의 독자들은 혼란과 어둠의 세계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블랑쇼의 '살아 있는 사유'는 명확하고 분명한 지침으로서 철학적 개념과 구별되는 것이지요. (p133-134)
135-6 136 137-9 139
이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아, 즉 주체Le sujet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 특히 주체가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완벽한 계획, 그 행위의 실천, 그리고 그런 주체로서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인간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의식적 주체인 자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나le Je'가 더 이상 확신에 찬 '나 자신le Moi'에 머무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 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념에 의문을 던지며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 무엇인가로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지요. 블랑쇼는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를 "무, rien'라고 이야기 하며, 작가가 아무것도 없는 이 ''무無, rien'의 상태로 부터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이 작가는 바로 의식 주체로서의 '나'로부터 벗어난 '무 아, leneant'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블랑쇼는 <불안에서 언어로 De l'angoisse au langage>라는 글에서 "작가는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글을 쓸 그 어떤 방법도 없으면서 항상 글을 써야 한다는 극도의 필요성에 강요받고 있다는 우스운 조건에 점점 처해지고 있다”(Maurice Blanchot, <De l'angoisse à langage〉, Faux pas, Gallimard, 1983, p.11)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처하고 있는 우스꽝스런 조건이 어쩌면 '무아'로서의 작가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작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인 '나'로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타유가 말했듯이 "두려움 속에 계속la continuité en horreur" (Georges Bataille, (L'expérience intérieure), Oeuvres complètes V, Gallimardm 2002, p.23: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글을 쓰고 있고, 또 계속 써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기운 빠지게 한다. 그 어떤 보장과 확신도 없이, 그저 두려움 속에서 계속 쓰고 있을 뿐이다.") 글을 쓰고 있는 그런 '무le néant' 인지도 모르지요. (p141-142)
블랑쇼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그의 글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서도, 그의 철학적 사유가 미숙해서도 아니지요. 그의 글과 사유가 답을 찾기보다는 사유와 삶, 삶과 글, 글과 사유의 경계를 허물고, 물음에 물음을 던지며 끊임 없이 생각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바이지요. 하지만, 철학과 삶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연결되어야 하는가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통하거나, 혹은 강의실에서 강좌를 통하여 접하는 철학이 삶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개입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블랑쇼를 읽으며 철학적 개념이나 사유의 주제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개입의 열려 있는 가능성과 발생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 또한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동적 중성 운동이 삶에 개입하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어제의 삶과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p143)
(144)
<기호의 모험가, 롤랑 바르트_김진영> ***
롤랑 바르트 <밝은 방> (p152)
말씀드린 것처럼 <밝은 방>은 어머니를 잃은 애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인 에세이입니다. 이 사진 에세이는 프루스트 Marcel Proust(1871~1922)의 무의적 기억에 비견되는 환희의 체험, 즉 사진적 푼크툼 Punctum 을 통해서 죽은 어머니와 재회한다는 마술적 엑스타지의 체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세이와는 달리 실제의 삶에서 바르트는 어머니 상실의 상처를 끝내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1980년 2월에 작은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 달 뒤인 3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바르트의 사망 이후 그의 죽음이 사고사이냐 자살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지만, 사고 자체는 사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트에게는 회복의 의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으며, 그런 경우 경미한 사고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근거로 바르트의 죽음을 자살로 보아야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비록 《밝은 방> 텍스트 안에서는 사진적 엑스타지 체험을 통해 죽은 어머니와의 재회가 성사되지만, 실생활에서 바르트는 어머니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는 애도 작업에 실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p152-153)
•푼크툼 바르트는 사진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스투디움Studium'과 '푼크툼'으로 양분한다. 스투디움은 호감과 관심의 영역에 속하지만 여전히 사진 이미지를 '읽는' 경험, 즉 지적 경험이다. 반면 푼크툼은 사진 이미지를 '보는' 경험, 즉 일체의 의미 코드를 벗어나서 사진 이미지와 만나는 육체적 체험이다. 중요한 건 스투디움과 푼크툼이 별개의 시각적 경험이지만 상호관련적이라는 사실이다. 푼크툼은 우연 발생적 경험이 아니라 스투디움을 해체 전복시키면서 생성되는 탈코드적인 시각 체험이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푼크툼 체험을 개인적인 이미지 체험이 아니라 존재론적 체험으로 이해한다. <밝은 방>이 죽음과 사랑의 테마를 다루는 두 담론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사진 이미지의 존재론적 입장 때문이다. (p153)
우리는 여기서 '부드러움'이라는, 바르트가 매우 즐겨 사용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드러움은 바르트 사유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바르트가 규정하는 어머니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방》에서 바르트는 여러 번 반복해서 어머니의 본질을 '부드러움', '선함', '착함'이라는 단어들로 설명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예컨대 《애도 일기》 (김진영 옮김, 이순, 2012)에서는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 즉 '얀세니트janseniste적인 엄격함'이 어머니의 또 다른 본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보는 어머니의 인격이 이 양가성, 즉 선함과 엄격함이 화해를 이룬 그 무엇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름 아닌 바르트 사유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 '자유'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유의 본질이 바르트에게 '자유'라면, 이 자유는 근대적 이성주의도 아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성부정적인 자유주의도 아닌 어떤 사유, 중심주의적인 것도 중심 해체적인 것도 아닌 어떤 사유, 바르트 식으로 말하자면, 경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나드는 부드러운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가 자신을 '부유하는 주체', '유동하는 주체'라고 말할 때, 그 주체 또한 이 부드러움을 주체성으로 지니는 자유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바르트의 지적 특성을 아버지 부재와의 관계 안에서 추론해 볼 때, 그것은 시끄러운 아버지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버지가 늘 어머니의 부드러움에 의해서 중심으로 매개됐으므로 형성될 수 있었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르트를 모던과 포스트모던 사이를 넘나드는 경계적 지식인으로 보고자 하는 일부 이론가들의 평가는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p156-157)
159
바르트는 이처럼 지도 없는 여행의 도중에서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새로운 감각 경험과 그 경험이 불러일으키는 탈코드적인 의미 생성들과의 만남을 '모험의 즐거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산길의 매력은 동시에 독서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독서에도 두 형식이 있는데, '목적을 지닌 독서'와 '욕망을 위한 독서'가 그것이죠. 목적을 지닌 독서가 연구나 교양을 위한 지적 축적의 독서, 시험이나 직업 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독서라면, 욕망의 독서는 무목적인적인 독서, 즐거움과 유희를 위한 독서입니다. 욕망의 독서를 즐거움과 유희로 만드는 것은 그 욕망의 대상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미 공백을 뜻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독서를 즐거움과 관능으로 바꾸는 이 무의미는 오히려 탈코드적 의미, 즉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축된 코드 체제가 강요하는 일체의 의미들을 해체하고 이탈할 때 비로소 발견되고 생성되는 의미의 경험을 뜻합니다. 바르트가 다양한 텍스트 안에서, 특히 <사랑의 단상> (김희영 옮김, 동문선, 2004) 안에서 '육체적인 것', '상상적인 것'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무의미한 것, 그야말로 시장에 내다 놓아도 아무도 소비하려 하지 않는 것, 코드화된 소통 체제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다만 나와 대상 사이에서만 생성되고 경험되는 감각적 소통, 그 어떤 코드로도 의미화될 수 없는 독자적인 것입니다. 바욘의 산길에서 유년시절 바르트가 사로잡혔던 매력은 풍경의 요소들과 바르트의 육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감각적 소통의 즐거움이며, 그 즐거움은 동시에 이후 바르트가 욕망의 독서를 통해서 육체와 문자 사이에서 관능적으로 체험하는 의미 생성 체험의 즐거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p160-161)
161-2 164-5
롤랑 바르트 <모드의 체계> (p167)
(167-8)
롤랑 바르트 <애도 일기> (p170)
(173)
<자크 라캉의 소유할 수 없는 편지_김서영> *
애드거 앨런 포 <도둑맞은 편지> (p177)
185 186-7
라캉은 <도둑맞은 편지>의 인물들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 편지를 잘 감추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설의 서사를 분석해보면 이 세 입장들이 편지를 중심으로 두 번씩 반복됩니다. 여기서 잠시 편지에 대해 다시 기억해볼까요? 프랑스어로 편지는 'lettre' 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를 뜻하기도 하죠. 제가 조금 전에, 기표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문자입니다. 기표의 중심을 텅 비게 만들어서 다양한 의미가 기표를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문자라는 구조죠. 우리는 문자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도 그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신비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소설에서 편지가 맡은 역할입니다. 편지는 모든 인물들을 움직이면서도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죠. 라캉은 그것을 '실재'라고 불렀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무관하게 문자에 의해 말해지고, 결정되고, 움직여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라캉은 편지를 중심으로 배치되는 인물들의 지도를 분석해낸 거예요. 어려운가요? 프로이트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죠. 무의식은 우리를 배치하고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라캉은 <도둑맞은 편지> 분석에서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 반복되는 삼각형은 그 이후의 무한한 반복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p189)
190-2 194, 7 200 201-2 204, 5 (206)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반역_최원> ***
알튀세르가 ISAs(이데올로기적 ��가장치들) 논문에서 제시한 중심적 테제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데올로기적 호명 테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호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알튀세르는 한 편의 작은 연극적 상황을 디자인합니다. 행인이 지나가고 있고, 경찰이 등 뒤에서 그 행인을 부릅니다. "이봐, 거기!" 그러면 이 행인은 경찰의 부름에 답해 돌아서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알튀세르는 이 행인이 주체로 구성된다고 말함니다. 따라서 주체는 이러한 호명의 효과인 것이지요. 원래 이 행인은 개인이었을 뿐 주체가 아니었는데, 호명에 의해 타율적인 방식으로 주체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호명 테제가 당시 주체에 대한 논의에 강력��� 개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체를 구성하는 위치에서 '구성되는' 위치로 옮겨 놓음으로써 주체를 근본적으로 자율성이 아니라 타율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알튀세르 이전에, 또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말하자면 구조주의 이전에, 프랑스 학계를 장악하고 있던 사상은 사르트르를 비롯한 실존주의였습니다. 이 사상은 주체의 실존적 결단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했지요. 하지만 주체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비단 실존주의에만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철학적으로 주체를 자율적인 존재로 정초한 사람은 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의 객관성의 근거를 외부 세계에서 찾기를 멈추고 오히려 시공간을 비롯한 주체의 인식의 선험적 형식 속에서 찾음으로써 칸트는 주체를 결정적으로 '구성하는' 위치에 놓았지요. 더 나아가 칸트는 도덕적 자유의지를 식욕과 같은 자연적 욕구를 채우거나 쾌락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자의自意, Willkür와 구분하고, 오히려 자의에서 주체 자신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힘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덕적 주체의 근본적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욕구에 의해 규정되어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면 그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건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면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알튀세르의 호명 테제는 주체를 자율적인 위치에서 타율적인 위치로 옮겨 놓음으로써 주체에 대한 과거의 사유가 답하지 못한 하나의 질문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곧 '주체들이 자율적인 존재라면, 왜 그들은 지배자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생각에 그토록 쉽게 설득 당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체를 이렇게 타율적인 존재로 규정하게 되면, '저항'이나 '반역'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알튀세르의 호명 테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은 쉽게 알튀세르 이전의 주체의 자율성 테제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데올로기가 갖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라캉의 논의를 끌어들여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슬라보예 지젝입니다. 1989년에 출간한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수련 옮김, 인간사랑,2002)이라는 책에서 지적은 알튀세르에 대한 몇몇 비판을 제출하는데, 그 핵심적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구성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완전한 방식으로 주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항상 어떤 나머지 또는 잉여로서의 공백 void을 남기는 방식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공백이야말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되는 상상적 동일성의 주체와 구분되는) 진정한 주체이며,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나중에 주체가 저항하고 반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주체는 사실 호명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이 주체가 없다면 호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공백으로서의 주체는 호명의 가능성의 조건이자 동시에 그것의 궁극적 실패의 원인을 이룬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주체 이전에 오는 (진정한) 주체가 있다'고 말입니다. (p212-214)
221-2
알튀세르는 예술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진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몇몇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에 크레모니니 Leonardo Cremonini(1925~)라는 화가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요긴한데요, 이 크레모니니가 그린 그림 중에 <욕망의 등 뒤에서 On the Back of Desire>(1966)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적 주체가 갖는 영원성이라는 환상의 구조입니다. 주체의 등 뒤에 다시 주체가 있고, 그 주체 등 뒤에 다시 주체가 있는 식으로 무한히 계속되죠.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안쪽에서 바라본 주체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동심원의 이러한 구조 안에서 우리가 계속 돈다고 해서 주체의 기원 또는 기원적 원인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알튀세르가 말하듯이 이데올로기에는 바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세상엔 이데올로기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는 그 자신의 외부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바깥, 특히 무엇보다도 그 이데올로기를 확립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라는 물질적 바깥을 비록한 외불를 가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바깥을 베일로 가림으로써, 바깥에 대한 망각을 조직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조건 지어진 존재가 아닌 자율적 존재인양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셔의 또 다른 그림을 여기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두 손이 서로를 그리고 있는 <서로를 그리는 손Drawing Hands>이라는 그림 아시죠? 이 손이 다른 손을 그리고 다른 손이 다시 이 손을 그리는 순환논리를 형상화함으로써 감상자가 계속 그 순환을 쫓아 무한히 돌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무한성의 환상은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의 작동이라는 이타성 또는 타자성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셔의 작품들에는 이를 주제로 한 작품이 아주 많지요. 영원성 또는 무한성의 구조를 생산하는 매커니즘은 설명 드렸듯이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에 의해 강제된 동일성이라는 '결과'를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향해 투영해 자신의 '원인'으로 만드는 목적론적 전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도를 통해 주체는 자신이 자기 원인인 듯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스스로를 자율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p225-227)
227-8 229, 230
그렇다면 이제 알튀세르에게 있어서 저항이나 반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중심에 놓여 있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이데올로기의 동심원적 구조를 탈중심화시키고 그 중심에 대신 이 실재를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절대적 외부, 이데올로기의 타자로서의 실재의 침입을 무대 위에 조직하는 것이 바로 저항과 반역의 시작이지요. 발리바르 Étienne Balibar(1942년~)의 유명한 논문인 <비동시성>의 한 각주에서 발리바르는 알튀세르가 저항이나 반역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하면서 그 사례를 바로 <맑스를 위하여>에 실려 있는 <피콜로 극장: 베르톨라치와 브레히트>라는 에세이에서 찾습니다. 이 글에서 알튀세르는 베르톨라치Bertolazzi의 원작 <우리 밀라노 사람들>의 파리 공연을 분석합니다. (p232)
그런데 이러한 실재의 난입은 이데올로기의 무대에 내적인 거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곧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외적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내에 어떤 균열과 공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또는 이미 이데올로기 안에 있지만 동시에 주체에 의해 부인되는 그 공백을 가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실재의 징후로서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존재하는 그 소실점을 하나의 불가능성으로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입되는 내적 거리를 통해, 관객들은 이제 이데올로기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투명한 과학적 의식을 확보하거나 이데올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판적인 배우들로 삶이라는 연극 속에 생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공연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는 배우들이며, 자기의 삶 속에서 비판적 사유와 행동을 시작하는 배우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튀세르는 이러한 비판적 거리, 따라서 저항이나 반역이 이데올로기 자체를 떠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내부에서, 이데올로기의 무대 위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한 각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통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욕망된 통일이며, 더 나아가서 욕망되거나 거부된 통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갈등과 투쟁의 장소이지, 단순한 환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p235-236)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발리바르지요. 발리바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오히려 피지배자들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들로부터 어떤 광범위한 인정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안에는 피지배자들의 승리와 패배, 승인과 거부의 기억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의 행복과 자유와 평등과 복지 등을 외치는 것이지요. 어떤 약속의 형식 속에서 말이지요. '우리는 거기로 전진한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만 거기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는 각자가 조금씩 희생해야 된다.' 발리바르는 그러나 어떤 정세 속에서 적대 (곧 실재로서의 적대)가 가시적이 될 때,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보편성은 깨져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피지배자들은 이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의 바깥으로 탈출함으로써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편성을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실현하려고 집단적으로 시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적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대라는 실재가 무대 위로 난입해 들어오게 될 때, 어떤 내적 거리가 가시적이 될 때, 피지배자들은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던 '이상'을 그 자리에서 실현하려고 집단 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식��는 맑스주의 이데올로기론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게 해줍니다.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단순하게 깨버리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전환시키는 작업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부르주아의 것이라고만 여겼던 시민권의 언어를 우리가 되찾아 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저항과 반역을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p237-238)
(239-240)
<미셸 푸코와 자기 변형의 기술_허경> ***
246-7 (253) 253, 5
푸코에 따르면 철학은 현재의 진단학, 오늘의 진단학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오늘-여기-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데카르트, 칸트 등으로 대변되는 '고전철학'과는 다른 '니체 이후' 철학의 특징입니다. 푸코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우주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문제를 탐구했던 고전 철학과 달리, 자신은 오늘 지금 '우리'의 문제, 곧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종류의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푸코는 "나는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의 어떤 구체적 인간이 어떠한가를 묻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간 본질, 존재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을 때의 '나'는 17세기 프랑스에 살던 데카르트라는 사람과는 무관한 그야말로 '인간 자체의 본질'에 대한 규정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러나 푸코는 바로 이러한 질문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17세기 유럽 프랑스의 에피스테메 épistémè 에 의해 고고학적으로 혹은 계보학적으로 구성된 사회적·역사적 구성물 social historical construct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푸코는 이 세상에 달력도 지도도 없이 이루어진 것, 곧 완성된 채로 하늘에서 떨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다, 그야말로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혹은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보이는 것'의 역사를 기술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광기, 섹슈얼리티, 영혼, 정신, 이성, 육체, 역사, 사랑, 진리, 학문 같은 것의 역사를 말입니다. (p255-256)
•에피스테메 이것은 원래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플라톤이 '이성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며 시공을 초월한 불변의 영원한 진리'를 의미하는 말로서 '감각에 의해 접근 가능하며 시공에 의해 제한되는' '의견, 억측'을 의미하는 독사doxa의 상대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푸코의 지식 고고학 시기에 출간한 <말과 사물>에서는 이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한 공간 내에서 '한 시대의 모든 지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식론적 근본 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에피스테메는 한 시대마다 오직 하나씩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에피스테메는 가령 북반구의 경우 관측되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로서 다른 모든 별들은 북극성의 주위를 따라 전개, 배치, 운행한다. 한마디로 푸코의 ���피스테메는 '한 시대, 한 공간이 갖는 인식론적 가능 조건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푸코에 의해 '인식론적 장 혹은 그것의 배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p256)
"나는 어떻게 오늘의 내가 됐는가?" 이러한 푸코 사유는 당연히 그 방법론이 '~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는 어떻게 구성됐는가'입니다. '~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하이데거가 자신의 '철학- 그것은 무엇인가? Was ist das-die Philosophie?'(1955)라는 강의에서 잘 밝혀주고 있듯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발명입니다. 가령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다. 아침에 피는 장미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등등의 대답을 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당신의 대답은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 질문은 당신이 대답한 것과 같은 아름다움에 대한 개별적 사례들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 각각을 아름다움의 한 사례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움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플라톤에게 이 '아름다움'(혹은 '선'이든 '잘 사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의 본질은 글자 그대로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 시공을 초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점에서 니체에 동의하는 푸코는 바로 이렇게 '어떤 무엇의 본질이 시공을 초월해 있다'는 생각 자체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사회적·역사적 구성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가령, 마르크스의 사유는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는 인류 역사 자체의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19세기 프러시아 사상가의 사유, 그리고 마르크스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사유 체계'입니다. 마르크스와 그에 동의하는 자들 역시 결코 달력과 지도를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p257)
우선, 진리라는 말 자체가 일본어입니다! 민족民族이나 주체성, 혹은 철학이나 이성이라는 단어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진리와 철학, 절대와 상대, 이성과 감정이 마치 역사가 없는 시공을 초월한 '진리'라고 느껴진다면 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서양화됐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구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푸코가 '나는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푸코는 이른바 지도도 달력도 없는 '진리'란 사실은 그렇게 구성된 하나의 진리 개념에 불과하며, 그렇게 구성된 진리 놀이의 틀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도록 '조건화'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것은 '주어진' 문제 틀 곧 영원불변하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 틀자 체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됐는가를 살피는 일일 것입니다. 푸코의 작업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각의 진리 개념들이 구성된 역사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삼는데, 푸코는 이런 역사를 진리의 정치사 political history of truth라고 부릅니다. 푸코는 이런 진리의 정치사 혹은 서구 합리성의 한계와 조건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지식, 권력, 윤리라는 세 영역과 고고학, 계보학이라는 두 방법론을 조합해, 지식의 고고학, 권력의 계보학, 윤리의 계보학으로 나눕니다. (p260-261)
260 ----> (1) 261, (2) 263, 4, 5 , (3) 266, 7, 8, 9
이처럼 푸코는 '나는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보다는 '나는 어떻게 오늘의 내가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가령 푸코가 묻는 질문은 '대한민국 사회의 본질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로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는가?'입니다. 푸코의 탐구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계기들, 지점들, 문제화, 문제설정들을 분석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화 혹은 문제설정에 대한 분석은 또 왜 하는 것일까요? 푸코에 따르면 자신의 이러한 모든 작업은 자기 변형transformation of the self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푸코는 트랜스포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것, 철학 활동의 목적은 자기가 배우는 것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 더 강화되고, 자신의 논증이 강화되는 방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앎에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푸코는 철학의 목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변형인 것이죠. 푸코의 이러한 사유는 이미 1969년에 발간된 <지식의 고고학>의 '서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얼굴을 갖지 않기 위하여 쓰는 사람이, 물론 나를 포함하여, 존재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게 묻지 말기를, 그리고 그대로 남아 있으라고 내게 말하지 말기를. 그런 질문은 우리의 서류를 지배하는 호적계의 도덕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쓸 때, 이 도덕이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기를."(<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2000, 41쪽, 번역 수정) (p270)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변형시키는 절차들, 문제화들, 과정들을 자기의 테크놀로지 technologies of the self라고 부르는데, 자기의 테크놀로지는 말하자면 '진리 놀이들을 변형시킴으로써 자기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제들, 정상들, 질문들에 대해 '왜' 그리고 '어떻게'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철학 활동인 것이고요, 이런 자기의 변형은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결합되면서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로마의 자기 인식, 자기 배려라는 두 축으로 펼쳐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한 것이 '성의 역사' 2, 3권 <쾌락의 활용>과 <자기 배려>의 내용입니다. 저는 푸코의 말년 인터뷰에 등장하는 아래와 같은 말이 푸코의 작업 전반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나의 목표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풍경의 일부가 실제로는 어떤 매우 정확한 역사적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분석은 인간 실존에 보편적 필연이 있다는 관념에 대립합니다. 나의 분석은 제도의 자의성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여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은 무엇이며 아직도 얼마만큼의 변화가 가능한가를 보이고자 합니다.(푸코, <진리·권력·자기>,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회원 옮김, 동문선, 1997, 22쪽, 번역 수정) 저는 이 말을 내가 왜 오늘의 내가 됐는지 알 수 있다면, 즉 나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인간 본성에 기인한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불변의 언떤 본질이 아니라 다만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단 하나의 지배적 관념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깨달음으로써 더 이상 꼭 지금처럼 살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말하자면 아직 오지 않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미래에 대한 상상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자유의 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p271-272)
(273)
<질 들뢰즈의 존잴론 새로 읽기_김재인> *
279 280-2
지금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실존existence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 이것을 있게끔 한 이전 시점의 또 무언가가 있겠죠. 이 과정을 반복해 가다 보면, 최초에 무엇이 있었냐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답이 제시됩니다. 한 가지 방식은, 들뢰즈가 이 입장인데요, 시작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가 실존하기 때문에 그 이전이 실존한다는 점만 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의 방식은, 자기는 탄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을 탄생케 한 게 있다는 추론입니다. 인과 사슬의 최초의 지점에서 비약이 일어난 것이지요. 들뢰즈 식의 내재적 존재론은 이 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계 내에서 지금이 있는 이상, 그 앞의 순간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경우에 앞과 뒤의 시간은 다르더라도, 양자는 모두 순간의 되풀이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순환'의 관점이 도입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순환 운동을 하는 무의식, 생산의 순환 형식을 고수하는 무의식이 우주 운행 또는 존재 생성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가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체로서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주체는 인간 주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산출해낸다는 의미에서의 주체입니다. 순환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최초의 원인, 초월성을 도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생산, 순환 운동이 정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들뢰즈가 보기에 지금껏 우리가 '자기 원인' 내지 '자기 생산'의 영역에 이르지 못한 것은 생산에 대한 인간주의적 착상 때문이었습니다. 성과 성욕에 관한 인간주의적 착상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있는 생산" (AO,p.21)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주 내지 존재 전체에 관한 한, 생산(성, 성욕, 욕망)은 부모가 없죠.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는 맑스의 '비-인간적 성' 개념을 참조합니다. 맑스는 "성의 의인적 anthropomorphique 재현"(AO, p.350)을 뛰어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적 재현이란 앞서 말한 크세노파네스가 비판한 관점을 가리킵니다. 하나의 성, 즉 인간주의적 성을 비판하는 것이죠. 하나의 성이란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식의, 성에 대한 착상을 가리킵니다. 들뢰즈는 성과 성욕을, 다시 말해 생산자와 생산물의 관계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생산의 운동 일반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의 자기-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을 들뢰즈는 'n 개의 성' 또는 '미시적인 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뢰즈가 페미니즘조차도 인간적 성에 갇히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조차도 '여성되기 devenir-femme'를 완수하는 와중에 생성 devenir 일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p285-286)
287
들뢰즈에게 생산의 종합은 '수동적 passive 종합'으로 이해됩니다. '수동적 종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종합은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passive, passion 또는 path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과 관련이 있는데요. 흔히 수동과 능동을 대비시키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능동인 것은 스피노자 식의 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 전체로서의 존재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다음 순간으로 밀쳐 나가니까 자기가 주체예요. 그런 점에서 능동입니다. 수동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에 있어 다음 순간에서 회고해봤을 때는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동이지만, 밀쳐나가는 주체로서의 우주 전체로 보면 능동입니다. 어떤 능동적인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는 말하기가 어렵죠. 특히 종합의 과정에서는 항상 수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현재 상태는 이미 무엇인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시간상 다음 순간에서 되돌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동적 종합이라는 게 우주와 관련된 적절한 표현인 것이죠. 그렇데 원래는 수동이라는 말이 적합한 번역이 아니에요. '겪는다'는 것이 진짜 의미예요. 영화 <잔 다르크의 수난The Passion of Joan of Arc>(칼 테오도르 드레이어, 1928)도 여기에서 유래하고요. 또한 정념이라는 번역도 그래요. 정념은 자기도 모르게 겪어서 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passion 이 수동이기 이전에 '겪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수동적 종합은 항상 어떤 일을 겪어왔죠. 다음 순간, 또 다음 순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전에 겪어서 지금이 됐고, 그 이전도 그 이전 순간을 겪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생산의 경과가 수동적 종합의 원리를 따르는 까닭은, 종합을 주도하는 초월적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뢰즈는 《천개의 고원》에서 인형극 놀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형극은 무대 위에서 실로 매달고 누가 조정하죠. 그런데 들뢰즈가 말하는 것은 실은 없고 인형들끼리 노는 거예요. 초월적인 끈이 없이 자기들끼리 질서를 잡고 노는 것이죠. 바깥에 조정자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종합을 총괄하는 필연적 법칙이 없다는 점에서 종합의 수동성, 즉 겪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p288-289)
고대 희랍철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들뢰즈에게 우주를 이루는 요소stoicheia는 '욕망 기계 machine désirante' 입니다. 자 여기서 욕망 기계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욕망 기계는 영어로 desiring-machin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동안 '욕망하는 기계'라고 번역을 해왔고요.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입니다. 욕망하는 기계라고 하면 기계가 주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욕망 désirante'은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욕망적 기계'입니다. 욕망은 기계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욕망적 기계라고 하면 욕망이 기계를 가동시킨다는 말이 됩니다. 욕망이 주어고, 기계는 일종의 껍데기라는 의미인 것이죠. 기계와 욕망, 둘은 분리될 수 없지만 둘이 결합되는 방식은 기계가 욕망하는 식이기보다, 욕망이 기계를 통해 분출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욕망 기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욕망적 생산production desirante'이라는 표현도 유사하게 이해야야 합니다. (p289)
290-1 293
기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술 기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계는 존재론적 요소로서, 우주의 생산에 내재적으로 관여합니다. 들뢰즈가 '기계'라는 개념을 창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주의적 가상을 벗어나 존재를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인간주의 humanism 내에서 우주의 운행은 '목적론'과 '기계론'의 두 양상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들뢰즈가 ���기에 양자 모두 초월성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목적론은 최초arche에 설정된 방향 telos을 따른다는 점에서, 기계론은 외부의 프로그램 설계자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작인을 가정합니다. 둘째로, '기계'는 생산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됩니다. 들뢰즈가 기술 기계는 고장이 나면 작동하지 않는데 비해 기계는 고장이 나면서만 작동한다고 거듭 강조할 때, '기계'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사실, 우주의 운행에 고장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적 관점에서만 고장이란 말이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무덤덤하게 운행될 따름입니다. 지진, 산사태, 홍수, 가뭄 등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재앙이지만 우주의 관점에서는 그저 생성이자 변화인 것이죠. 자기 안에서 계속 달라져가는 연속일 뿐인 것이에요. 우주가 매 순간 지속되고 이어진다는 게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 우주는 폭발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바로 이처럼 우주의 운행 내지 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기계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기계를 가동시키는 추동력, 힘, 동인입니다. 그리하여 기계는 홀로 있지 않고 욕망을 내재적 추동력으로 지닌 채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기계는 일차적으로 '욕망 기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는 기계들이며, 그 내재적 가동 원리가 바로 욕망입니다. (p293-294)
그런데, 이런 생산의 생산은 '기관 없는 몸 corps sans organes'의 생산을 낳습니다. 생산의 경과의 와중에 "모든 것이 한 순간 정지하고, 모든 것이 응고된다(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재개된다)"(AO, p.13)는 것이죠. 정지하고 응고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관 없는 몸은 생산의 생산이라는 2항 계열 (생산하기 - 생산물 생산하기⋯) 곁에서 제3항으로서 생산됩니다. 계열은 계속 뻗어나가는데요. 그러면서 한순간 응고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순간의 상태가 바로 기관 없는 몸입니다. 생성의 계열에서 한 단면을 끊어내는 것이죠. 기관 없는 몸은 생산의 경과 속에서 정지와 응고로 등장하는 한 순간 상태입니다. '생산의 생산'이 멈추는 한 순간, 이는 마치 우주의 한 순간을 찍은 스냅사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멈춤은 영원한 멈춤이 아니라, 곧이어 et puis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의 틈의 순간이죠. 모든 것이 정지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이 시간'인 것입니다. 존재의 운행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며 창조될 수 있으려면, 그 내부에 틈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틈이 순간이며,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간 계기입니다. 기관 없는 몸은 기존의 규정성이 박탈되고 해체되어 규정성을 상실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상태입니다. 물론 바로 새 규정을 부여받는 다음 순간 상태로 이행하지만 말입니다. 기존 것들이 무화되고,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주의 운행은 순간의 단절을 내포합니다. 기관 없는 몸은 '죽음 본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생성이 계속되려면 죽음이 필연적 계기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학 이전에 존재론 차원에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주의 삶의 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단절이, 끊어냄이 없다면 시작이, 탄생이, 새로움이, 창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성은 죽음을 그 심장에 품고 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재 활용됩니다. 바로 이 재활용recycle이 우주의 순환cycle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주는 매 순간 죽습니다. 그러나 또 매 순간 탄생합니다. 끊어지고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멈춰있는 것입니다. 끊어지고 달라져야 생성입니다. 따라서 끊어짐, 정지는 생성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고요. 리비도를 에너지로 갖는 워킹 머신 working-machine이 우주의 생성에 필연적 요소이듯이, 죽음 본능 또한 필연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사랑과 죽음이 함께 하죠. 작동의 한 계기로서, 생성의 한 단면으로서 죽음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파괴의 욕망으로 머무르게 되죠. 전쟁이나 파시즘이 그거예요.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것이 해체되어야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술이 대표적이에요. 이 둘을 분별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에 대한 개념이라고 들뢰즈는 말합니다. 앞의 2절에서, '인간적 성'이 아닌 '비인간적 성' 내지 '우주적 생산'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분별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p298-300)
(305)* (306)*
<해체, 차이, 유령론으로 읽는 자크 데리다_진태원>
그렇다면 데리다가 '데콩스트뤽시옹' 또는 '해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시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데리다가 “해체의 일반 전략" <데리다, 박성창 옮김, 《입장들>, 솔, 1991, 64쪽)이라고 부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전략은 먼저 전복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은 기존의 형이상학적 대립 구도가 폭력적 위계 질서임을 뜻합니다. 이원적인 대립쌍 (예컨대 음성 대 문자기록, 현존 대 부재, 이성 대 감성 등)으로 이루어진 형이상학적 질서는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질서죠. 따라서 형이상학의 해체는 우선 이러한 위계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다른 항에 의해 지배되고 억압되어왔던 항의 권리를 복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데리다 작업의 주요 주제였던 문자기록écriture (이 개념은 보통 '글쓰기'라고 번역되지만, 적절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죠. 데리다가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 Dela grammatologie>(1967, 아쉽게도 이 책의 국역본 중에는 신뢰할 만한 판본이 없습니다)나 <문자기록과 차이 Écriture et la différence> (1967, 국역본은 <글쓰기와 차이>,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1) 같은 책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플라톤에서부터 루소를 거쳐 후설, 소쉬르, 레비-스트로스에 이르는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에서는 문자기록을 폄하하고 음성이나 말을 중시하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는 점 입니다. 곧 이 사상가들은 모두 진리 내지 로고스logos는 말이나 생생한 대화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으며, 문자기록은 진리와 거의 관계가 없는 단순한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문자기록은 아주 위험한 도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자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생생한 대화 및 기억 능력을 퇴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데리다가 초기 작업에서 보여 주려 했던 것은 이처럼 진리 내지 로고스와의 관계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문자기록이 사실은 로고스 자체를 성립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왜 문자기록이 이러한 조건의 지위에서 배제되고 또 억압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구조적·역사적 필연성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리다의 해체 작업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음성에 대해, 로고스에 대해 문자기록이 우월하다는 점일까요? 데리다는 기존의 위계적 지배 질서를 전복시켜 그중 열등한 위치에 있던 것을 새로운 지배항으로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기존 질서를 되풀이하고 재생산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해체의 일반 전략은 단순히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이전의 체계 속에서는 이해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돌발적인 출현" (《입장들>, 66쪽), 지배 질서의 "긍정적 전위" (《입장들》, 93쪽)를 시도하고, 위계 구조 자체의 해체를 시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p311-312)
데리다가 볼 때 소쉬르 구조언어학의 중요성은 이런 언어관을 해체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차이의 체계로서의 언어 개념 덕분에 이제 언어를, 이미 현존하는 것(신의 말씀이나 자연적 사물 또는 정신 안의 관념 등과 같은 것)을 '재현하고 표상하고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언어는 단순히 사물을 지시하거나 재현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자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언어 이전에는 세계 그 자체, 자연 그 자체에도 역시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리다가 보기에 역설적이게도 소쉬르는 음성만이 자연적이거나 본래적인 기표이며 문자기록은 음성 기표에 대한 부차적이고 외재적인 도구라고 주장함으로써, 전통적인 음성 중심주의 및 로고스 중심주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De la grammatologie. 1부 2장, <언어학과 그라마톨로지> 참조) 따라서 데리다가 '원기록'이라는 새로운 기록 개념을 제안하는 것은 소쉬르의 언어학 혁명에 담긴 함의 (전통적인 언어관을 전복하는 '차이의 체계'로서 언어)를 급진화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놓기 위함입니다. 원기록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종래의 문자 기록 개념이 전제하는 바와 같은 재현관계, 곧 이미 현존하는 사물과, 언어나 기호 또는 기록 사이의 일치나 상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호 내지 언어가 차이의 체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에 앞서 있는 그대로 현존한다고 간주된 세계 내지 자연 또는 '현실' 역시 차이 작용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원초적인 기원 및 궁극적인 목적/종말 같은 것들과 더불어 주체 역시 차이의 작용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현존과 동일성은 차이에 앞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차이의 작용에서 산출된 것이며, 그 내부에 차이와 타자성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기원은 항상 그것에 선행하는 어떤 타자의 흔적이며, 현존은 흔적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기록은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 différance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p314-315)
316, 7
이렇게 본다면 dé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은 '해체'로 옮기기보다는 '탈구축'이라고 옮기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해체라는 말이 무너뜨리고 철거하고 더 나아가 제거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데 반해, 데리다가 말하는 déconstruction은 '해체의 일반 전략'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곧 déconstruction은 기존의 형이상학적 지배 질서를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본질주의적이고 동일성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기존의 질서를 되풀이 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 내지 짜임새를 형성하려는 노력, 곧 새로운 지배 질서를 구축하지 않으려는 운동으로서의 탈-구축의 운동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해체'라는 말이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정착되어온 만큼 이 번역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단지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탈구축의 운동을 포함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p318)
321, 3, 4 329, 330, 1, 5
데리다에게 시간이 '이음매에서 어긋나 있음은, 어떤 불순한 시대 상황을 의미하거나 시간의 질서의 일시적인 일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서 안에는, 따라서 현존으로서 존재의 질서 안에는 근원적인 탈구와 이접, 간극이 존재함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탈구와 이접, 간극은 존재자들 및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불행한 숙명·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장래가 도래하기 위한 조건이자 정의가 실행되기 위한 기회를 나타냅니다. 현재들의 시간적인 연속, 곧 과거 현재에서 지금 현재로, 또 지금 현재에서 미래 현재로 나아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은 계산 가능성의 질서이면서 또한 인과적인 응보의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 "법, 분배의 계산, 복수 또는 징벌의 경제"(<마르크스의 유령들>, 59~60쪽)입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어긋남이나 간극은 이러한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이 나타내는 계산 가능성과 응보의 질서에 균열을 냄으로써, 법적인 처벌과 보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정의의 도래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p336-337)
(338)
<줄리아 크리스테바, 혐오스러운 매력의 영역으로_조광제> ****
(342)
어찌 보면, 취하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위해 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버리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에는 뉘앙스를 달리하는 여러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분비, 배출, 배제, 축출, 유기[버림] 등이 그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원용해서 말하면, 삶은 분비, 배출, 배제, 축출, 유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분명 삶은 한편으로 버려지는 것들을 근본 지평으로 삼지 않고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적인 사유에서는 버려지는 일체의 것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것, 이를 적극적으로 주제로 삼아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사유를 펼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입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사유를 위해 그녀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철학적인 개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아브젝시옹abjection'과 '아브젝트abject' 입니다. 이 두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그녀의 주저라 할 수 있는 《공포의 권력》인데요. 이 책이 '아브젝시옹에 대한 시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아브젝시옹'은 이 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개념은 그녀가 맨 처음 주조한 다른 개념들, '세미오틱le sémiotique', '시니피앙스signifiance',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é' 등과 더불어 그녀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 개념이지요. 특히 이 개념은 프로이트가 제시한 '두려운 낯섦 das Unheimliche, the uncanny [섬뜩함]'과 일정하게 대립적인 짝을 이루기도 하고,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1942~)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개념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프로이트의 '두려운 낯섦'은 평소 친숙한 것이 느닷없이 섬뜩한 이질성을 띠고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데 반해,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매혹적인 것으로 다가올 때 성립합니다. 감정의 방향이 반대인 셈이지요.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는 사회적인 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립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서 사회로부터 법 외의 존재로서 축출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는 일체의 이분법적인 경계 전체의 바깥에 존재하는데, 이 아브젝트를 축출하는 것이 주체가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와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 이 두 개념은 한 쪽은 사회적이고 다른 쪽은 개인적이라는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 그 구조가 워낙 유사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테바는 개인과 사회집단의 현존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 사회는 모성적인 내지는 여성적인 것을 아브젝트로 축출함으로써 그 현존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크리스테바에게서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는 바로 모성과 여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크리스테바는, 페미니즘 이론계에서 그 지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긴 하지만 페미니즘의 중요한 이론가로서 특히 영국화 미국 쪽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p345-346)
•자아, 초자아, 이드 프로이트는 《새로운 정신분석》 (임홍빈·홍혜경 옮김, 열린책들, 2007)의 <심리적 인격의 해부>에서 정신의 세 가지 층위, 즉 초자아, 자아, 이드를 제시한다. '자아'는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마치 타자를 다루듯 할 수 있는 활동 주체이다. '초자아'는 양심을 내세워 항상 자아를 금욕적으로 감시하고 처벌을 내세워 위협한다. '이드'는 자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면서 오로지 쾌락만을 충동질한다. 자아는 초자아에 의해 옥죄이고 이드에 의해 충동질되면서 그와 동시에 현실에 의해 거부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p346)
아브젝시옹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포의 권력>에 들어 있는 핵심 대목들, 특히 '아브젝트abject'와 '아브젝시옹abjection'에 관한 대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단락을 시발점으로 삼아 아브젝시옹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존재'étre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가능적인 것 근처,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근처에 던져져 있다가 거기로부터 불쑥 튀어나와, 바깥에서부터 혹은 안에서부터 존재에게 나타나 다가온다. 이같이 존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존재는 폭력적으로 그리고 칙칙하게 여러모로 반항을 한다. 아브젝시옹에는 존재가 일으키는 그런 반항 중 하나가 들어 있다. 그것은 욕망을 요청하고 불안하게 하고 매혹시킨다. 하지만 욕망은 스스로를 현혹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욕망은 겁에 질린 채 뒤돌아선다. 욕망은 메스꺼움을 견디지 못해 토악질을 한다. 절대적인 어떤 것un absolu이 치욕으로부터 욕망을 보호한다. 이에 욕망은 자부심을 느끼고서 절대적인 어떤 것에 들러붙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로 그때, 그 비약, 그 경련, 그 도약은 저주 받은 것이자 유혹적인 다른 어떤 곳un ailleurs을 향해 이끌린다. 유혹과 혐오가 결집�� 한 극점이, 마치 제어할 수 없는 부메랑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를 그 자신의 바깥으로 내쳐 그 자신에게서 미끄러지듯 겨우 붙어 있게 한다. (<공포의 권력>, 9/21)'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찬찬히 생각해봅시다. 우선 맨 처음에 등장하는 문장인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존재'를 나의 존재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평소의 역량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서부터 어떻게 대처할 수조차 없는 것이 나타나 나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협하는 것이 미리 말하자면, '아브젝트'입니다. 이 놈은 그야말로 이상합니다. 나로 하여금 지성이나 이성을 앞세워 대처할 수 없도록 하고, 오히려 나에게서 기묘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와 동시에 그 나의 욕망을 함부로 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덫에 걸린 것 같이 내가 가까스로 나의 존재를 위험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기묘한 체험을 '아브젝시옹'이라고 말합니다. (p349-350)
토악질을 한다는 것은 섬뜩한 것을 내 몸으로부터 배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내 몸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크리스테바는 그것을 '절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일까요? 아니면, 생명 자체의 절대성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금기의 상징 체계일까요? 맨 마지막의 선택지, 즉 사회적인 금기의 상징 체계가 가장 그럴 듯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절대적인 어떤 것'은 '아브젝트'와 대립되는 것인데, 크리스테바에게서 아브젝트는 결국 사회적인 금기체계에 의거한 질서를 무효한 것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괴물이 내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히 치욕스러운데다 그 괴물 때문에 겁에 질려 있으니 더욱 치욕스럽겠죠. 그런데 그 괴물이 나를 유혹하려 합니다. 더러운 괴물에게 유혹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는 나를 더욱 더 치욕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느꼈을 때, 그 유혹을 느끼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동, 충동으로서의 욕망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적인 금기의 상징 체계와 근원적인 존재의 충동 간의 급격한 대결이 벌어지는 장면이 바로 아브젝시옹인 셈입니다. (p352)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어떤 것'이 그런 치욕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보호막,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보호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호막은 상징 체계로서의 랑그 즉 체계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은 우리로 하여금 구토를 통해 분비, 배출, 배제, 축출, 유기를 일삼도록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근원적인 욕망 차원에서 나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매력을 분출하는 기묘한 그것을 분비, 배출, 배제, 축출, 유기했다는 데서 나는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것'에 의해 자부심을 느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다른 어느 곳'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곳으로 가면 저주 받아 마땅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에 혐오스럽기 그지없는데도 왠지 한껏 매혹적이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부메랑 이야기가 실감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힘껏 멀리 던지면 던질수록 더욱 강한 힘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이지요. 너무나 혐오스럽기에 힘껏 뿌리쳤더니 오히려 더욱 더 강력한 유혹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혐오와 유혹의 극단적인 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젝시옹은 이러한 극단적인 양가적 감정 상태에 빠져버린 것을 지칭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는 내 바깥에 내동댕이쳐져 있고 겨우 미끄러지듯 나에게 들러붙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나는 도대체 주체 sujet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는 분별을 바탕으로 한 인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p353)
아브젝트 이때 혐오와 유혹이 극단적으로 결합된 이 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그 괴물을 내쫓으려고 하는 만큼, 오히려 그 괴물이 나를, 말하자면 나를 나의 주체 상태로부터 내쫓아버리는 그 기묘한 괴물. 그 괴물은 과연 대상objet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말하자면 아브젝시옹은 대상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브젝시옹이 분명 체험 내지는 경험임에는 틀림없는데 대상을 갖지 못한다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크리스테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젝시옹에 의해 공격을 당할 때, 내가 그렇게 요청하는 감정들affects [흔히 '정'이라 번역하는데, 너무 물리적인 느낌이 들어 이 글에 서는 '감정'이라고 옮깁니다.]과 사유들의 그 꼬임 torsade 은, 제대로 말하자면, 정의될 수 있는 대상objet을 갖지 않는다. 아브젝트abject는 내가 지칭하고 내가 상상하는바 나와 마주해서 내 '앞에 던져져 있는 것objet'이 아니다. 아브젝트는 더 이상 '앞에 있는 놀이 감ob-jeu', 즉 욕망의 체계적인 탐색에서 무한정하게 달아나는 작은 'a(petit )'가 아니다. 《공포의 권력》, 9/21)' (p354)
355
'아브젝트abject는 나의 상관자mon corrélat가 아니다. 즉 아브젝트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나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소나마 나를 부각시켜 자발적이게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대상으로 보자면, 아브젝트는 [그 대상의] 하나의 성질 qualité '나와 대립 된다s'oppose a je'는 성질- 일 뿐이다. 그러나 대상이란 [나와] 대립됨으로써 의미의 욕망이 펼치는 깨어지기 쉬운 음모의 구도 속에서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로 아브젝트 즉 추락한 대상objet chu은 근본적으로 '축출된 어떤 것un exclu'으로서 의미가 붕괴되는 곳으로 나를 이끈다. 그 주인인 초자아sur-moi와 섞여 녹아버린 어떤 하나의 '자아 (un certain )', 그 '자아'가 가차 없이 [대상을] 축출해버린 것이다. (《공포의 권력》, 9/21~22)' 위 인용문을 보면 크리스테바는 전적으로 라캉의 '오브제a'에 관한 이야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이 펼치는 깨어지기 쉬운 음모의 구도'는 바로 라캉이 말하는 욕망의 구도를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도 성립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의 지대로 이끄는 것, 그리고 초자아와 결합된 자아에 의해 가차 없이 축출됨으로써 추락하고 만 대상이 바로 아브젝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아브젝트는 라캉이 말하는 실재에서 솟구친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라캉이 말하는 바 결코 돌아갈 수도 없고 충족될 수도 없는 유아와 어머니 간의 완전한 성적 결합과 그로 인한 희열jouissance을 아브젝트의 출현과 그로 인한 아브젝시옹의 체험을 통해 되살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테바가 어머니의 몸, 즉 모성적인 몸을 아브젝트의 대표적인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p356-357)
359
사실 아브젝트는 내가 주체적인 자아로서 존재하기 위해 축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젝트는 결코 곱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출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로서 존재하려는 나를 위협하면서 내 존재를 소스���치게 만들고 급기야 비명을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키도록 해서 나의 에너지를 소진케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광기에 의한 발작은 곧 아브젝시옹에 함축된 반항이 초자아와 이에 의존한 주체적인 자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초자아에게는 아브젝트가 상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발작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젝트에 의해 아브젝시옹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지경에 이르면, 도덕적인 규범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연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질서와 규칙마저도 온전히 빛을 잃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한 곳이 바로 '바깥'이고 '다른 어떤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카오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크리스테바는 《시적 언어의 혁명》에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원용해 '코라chora'라는 개념을 끌어들인 바 있습니다. 그 핵심 대목만을 인용해보기로 합니다. '코라는 충동들과 충동들의 정지에 의해, 통제된 만큼이나 기복이 심한 운동성으로 구성되는 비표현적인 총체성이다. '정신적인' 표식인 동시에 '에너지의' 충전인 충동들은 우리가 코라라 부르는 것을 분절한다. (…) 코라 그 자체는 단절과 분절들, 리듬으로서 명증성, 진실한 것 같은 것, 공간성, 그리고 시간성에 선행한다. (…) 모형도 아니고 복제도 아닌 이 코라는 형상화figuration에 선행하면서 그 심층에 깔려 있고, 따라서 거울작용specularisation에 대해서도 선행한다. 그러면서 이 코라는 음성적이거나 운동적인 리듬에 대한 유추만을 허용한다. (<시적 언어의 혁명>, 23~24/26~27)' (p360)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코라는 우주의 원 재료인 게네시스genesis가 놓인 곳으로서 게네시스의 유모 내지는 자궁으로 지칭됩니다. 게네시스는 카오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코라는 카오스가 존재하는 원 공간으로서 코스모스를 구성해 내는 원동력으로서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규칙적이고 질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규칙과 질서를 근원적으로 떠받치는 공간성이나 시간성조차 뒤로 물리면서 앞서 있는 것이 코라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테바는 이 코라를 충동들을 통해 오로지 음률적인 리듬, 즉 세미오틱한 것le sémiotique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재규정 합니다. (p361)
지면 상 그녀가 말하는 코라가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젝트가 축출되어 있는 바깥과 어느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가를 섬세하게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충동과 아브젝시옹의 상태에 빠진 자아와 어느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가도 역시 섬세하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현대 문학은 초자아적인 혹은 도착적인 입장들을 견지하는 데서 쓰이는 것 같다. (…) 도착으로서 현대문학은 아브젝트를 위해 거리를 유지한다. 아브젝트에 매혹된 작가는 아브젝트의 논리를 상상하고, 아브젝트에 몸을 맡기고, 아브젝트를 투입하고, 결국에는 체계언어 langue (스타일과 내용)를 전복시킨다." (《공포의 권력》, 23/41)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그녀가 볼 때 현대문학이 위에 서 잠시 말한 바 "충동들을 통해 오로지 음률적인 리듬"일 뿐인 세미오틱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양쪽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기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리스테바는 《공포의 권력》에서도 코라와 충동을 '낯선 공간', 즉 '다른 어떤 곳'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원을 말하지 말자. 그보다는 상징 기능이 더욱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바 그 상징 기능의 불안정성, 즉 모성의 몸corps maternal에 대한 금기 (자기애에 대한 방지 및 근친상간의 타부)를 말하자. 여기에서 우리가 플라톤과 더불어 하나의 코라une chora 즉 하나의 용기라고 지칭하고자 하는 낯선 공간étrange espace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것은 바로 충동이다. (《공포의 권력》, 21/38)' (p261-262)
•세미오�� 크리스테바는 언어를 구성하는 시니피앙스signifiance즉 의미 생성의 과정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두 양태를 추출하여 그 나름의 이름을 붙인다. 하나는 쌩볼릭le symbolique 이고, 또 하나는 세미오틱le sémiotique이다. 이에 관해서는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을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시니피앙스와 견주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테바는 사회 조직들이 이미 항상 쌩볼릭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쌩볼릭은 우주를 만들 때 이미 늘 존재해 온 이데아적인 형상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세미오틱은 우주의 재료 자체가 비록 혼란된 상태이긴 하나 그 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변별적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세미오틱이 쌩볼릭과 변증법적으로 조응하여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플라톤에서 우주의 재료가 되는 게네시스는 코라라는 공간 속에 있는데, 이 코라의 운동에 따라 게네시스가 일차적으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게네시스 속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변별적인 요소들은 코라의 리듬적인 운동에 의거해서 분류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chora sémiotique' 즉 세미오틱한 코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미오틱은 언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변별적인 리듬인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테바는 순전히 세미오틱한 비발화적인 기표체계로서 음악을 든다. 언어에 스며들어 있는 변별적인 리듬 자체가 바로 세미오틱이다. (p362)
364 365-6
•희열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희열jouissance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의 완전한 성적인 결합을 이룰 때 생겨나는 감각적인 절정을 일컫는다. 이는 어른으로 성숙한 뒤, 결코 돌아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서 라캉이 실재라 일컫는 영역에서의 일이다. 상상으로서도 불가능하고 상징적인 미세한 작업에 의해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실재, 즉 어머니와의 성적인 완전한 합일의 상태에서 오는 감각적인 절정이 바로 희열 즉 주이상스다. (p367)
우유, 근원적 아브젝트인 어머니의 몸 이 정도쯤 되면, 다시 말해 숭고함을 통해 환희로운 주체로 이끄는 것이 아브젝트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바로 나에게 아브젝트로 다가온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테바의 이 아브젝트 내지는 아브젝시옹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그녀가 정신분석학적인 구도 속에서 그 구도를 넘어서려고 애쓰는데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그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아브젝시옹으로서 음식물에 대한 혐오를 거론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합니다. 우유가 오래되어 피막이 생긴 것이 아브젝트로 작동하면서 아이가 그 우유에 대해 구토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우유 크림에 대해, 시선을 흐리게 만드는 현기증과 더불어 구토가 일면서 내 몸을 활처럼 휘게 만든다. 그리고는 그 구토는 우유 크림을 준 엄마와 아빠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 그들의 욕망을 나타내는 기호인 그 요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것에 동화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축출한다. 그러나 이 음식물은 그들의 욕망 속에서 존재할 뿐인 [나의] '자아'에 대해 '타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축출한다. 나는 나를 뱉어낸다. 나는 '내'가 나를 정립하고자 하는 바로 그 운동으로 나를 아브젝트하게 만든다m'abjecte. (…) 그들은 내가 나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타자가 되는 중에 있음을 안다. '내'가 생성되는 이 회로 속에서 나는 오열과 구토의 폭력이 자행되는 가운데 나moi를 낳는다. 분명히 상징 체계 속에 기입되는 침묵어린 증세의 저항과 경련을 일으키는 소란스러운 폭력, 그러나 상징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상징 체계에 포섭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포섭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드는 반발하고, 억압을 풀어헤친다. 이드가 아브젝트하게 한다. (《공포의 권력》, 10~11/23~24)' (p367-368)
아브젝트로서의 나와 자아로서의 나가 어떻게 동시에 발생하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 발생의 배경은 유아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 내가 타자(부모)의 욕망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타자를 축출함으로써 아브젝트로 만드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축출해서 아브젝트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를 부패한 우유를 토해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자아로 정립되어 상징 체계에 포섭되는 것이지요. 이때 자아는 기실 토해낸 내지는 축출된 것이기에 바로 아브젝트로서의 자아입니다. 그러나 상징 체계 속에서 아브젝트로서의 나는 저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상징 체계에 편입된 나를 나의 이드가 가만히 놔둘리가 없지요. 당연히 반발하면서 억압을 풀어내고자 하겠지요. 말하자면, 상징 체계에 순응하고 있는 나의 자아의 억압된 이면인 아브젝트인 나를 들쑤셔 상징 체계에 저항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드였던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젝트를 만나 내가 아브젝시옹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나의 이드가 반란 을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p368-369)
비록 승화 과정을 통해서이긴 합니다만, 아브젝시옹이 결국 환희와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 이드의 반란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젝시옹은 무의식적인 억압을 뚫고 나온 것이며, 그런 점에서 무의식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젝시옹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낯섦'과 다를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렬하다. 아브젝시옹은 근친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구성된다. 친숙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기억의 그림자조차 없다."(《공포의 권력》, 13/27) - "여기에서 '무의식적인' 내용은 배제된다. 그러나 묘한 방식으로 배제된다."(《공포의 권력》, 15/29) (p369)
이 정도쯤 되니, 아브젝트는 도덕이 자아의 쾌락 충동을 억압한다고 해서 그 도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젝트를 일으키는 것은 결백이나 건강이 부재한 것이 아니다. 동일성과 체계 그리고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경계, 장소, 규칙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 도덕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브젝트가 아니다. (…) 아브젝시옹은 몰도덕적이고, 음흉하고, 역류하는 것이고 사시적인 것이다."(<공포의 권력> 12/25) 법과 도덕을 잘 알면서도 짐짓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아브젝시옹이라는 이야깁니다. 크리스테바는 문학이든 예술이든 종교든 이 아브젝시옹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핵심 문제라고 봤습니다. 예컨대 종교의 역사는 아브젝트를 정화하는 다양한 양식들을 개발해낸 역사라고 말하고, 예술적인 경험은 아브젝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아브젝트를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근대성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위기를 근거로 해서, 아브젝시옹은 원죄 이전의 상태에서 공명하는 바를 이끌어낸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타자'Autre가 붕괴된 세계에서 상징적 구축물의 기반에까지 내려가는 미학적 노력은 말하는 존재의 깨어지기 쉬운 경계들을 그 시발점에 가장 가까운 곳, 그 바탕없는 기원에까지 되집어나가는 데서 성립한다. (…) 도스토예프스끼, 로트레아몽, 프루스트, 아르토, 카프카, 셀린 등 이들의 위대한 현대문학은 아브젝트들의 지대 위에서 펼쳐진다. (25/43)' 아브젝트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밑바탕이자 근원적인 지평을 형성하기에, 그 역사성에 있어서나 편재성에 있어서 워낙 근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맞닥뜨리는 순간 섬뜩한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강렬한 매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브젝트를 맞닥뜨리는 아브젝시옹의 체험이 우리에게 과연 어느 정도로 다가와 있는지요? (p369-370)
(371-2)
<다시 알랭 바디우의 진리 철학_서용순> ***
바디우가 '철학의 종말'이라는 근대철학 비판의 주장에 반대하여 철학을 옹호하는 정통 철학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철학의 종말이라는 테마에 대한 바디우의 비판에 대해서는 Badiou, Manifeste pour la philosophie, Seuil, 1989, pp. 7~12; 《철학을 위한 선언》, 서용순 옮김, 도서출판 길, 2010, 41~48쪽 참고) 그는 여러 저작에서 철학을 복권시키는 한편, 이전의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예술이나 정치, 과학과 같은 철학 외부의 영역에 철학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철학의 중심 테마인 진리를 포기하지도, 철학의 중심 범주인 주체를 폐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디우가 무작정 전통철학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디우를 읽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바디우는 '철학'을 위해 근대철학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며, 그 비판에서 벗어나는 철학을 수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바디우의 손에서 진리와 주체의 범주는 완전히 개조되는 것입니다.(Manifeste pour la philosophie.pP. 59~75: 번역본, 117~136쪽 참고) 바디우는 철학을 쇄신함으로써 철학자들 자신이 철학에 대해 갖는 회의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예컨대 그는 철학을 다시금 진리를 사유하는 사유로, 다시 말해 '사유의 사유 pensée de la pensée'로 규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상 바디우의 모든 철학적 성찰은 정치적인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바디우는 정치에 어떤 특권적인 지위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동등하게 진리의 생산이라는 정치의 역할에 주목하지만 말이지요.(바디우는 정치적 사건의 질서를 다른 질서로 환원시키는 시도에 반대하며, 정치적 진리를 집단적인 것의 운명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당대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Manifeste pour la philosophie, pp. 65~66: 번역본. 123-125쪽 참고) 바디우의 철학에 있어 '정치', 즉 제도적인 정치가 아닌 해방적 정치에 있어서의 실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p376-377)
바디우의 철학적 혁신은 근대 비판에 대한 숙고로부터 출발합니다. 니체와 하이데거로부터 출발하여 프랑스 현대철학에서 절정에 이른 근대철학에 대한 비판은 분명 강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 비판을 통해 철학을 지배했던 전통 형이상학은 마침내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여겨졌고, 시스템을 추구하는 거대 담론은 철학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비판은 주로 진리와 주체라는 철학적 범주에 집중된 것이었지요. 《철학을 위한 선언》에서 바디우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철학에 대한 비판은 철학에 대한 욕망을 ���지하고, 진리가 아닌 다른 지시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Manifeste pour la philosophie, pp. 7~8: 번역본, 41~42쪽) 리오타르 Jean-François Lyotard(1924~1998)의 말처럼 건축술로서의 철학은 붕괴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철학은 자신의 주요한 근거를 다른 곳에서 구하려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플라톤이 철학에서 추방했던 '예술'입니다. 철학은 새로운 장소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우회가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철학자들 자신이 추인했다고 여겨지는 정치에 대한 공포가 잠재해 있습니다. 철학이 이른바 '전체주의 정치'(나치즘, 현실 사회주의 등등)의 탄생에 일조했다는 바로 그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더 이상 철학이 진리를 욕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철학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정치에 대한 사유를 일거에 중단해버렸다는 것이 바디우의 분석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자학적인 입장입니다. 철학자들은 스스로의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철학을 다시 사유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고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지적 태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Manifeste pour la philosophie, pp. 8~11; 번역본, 42~47쪽 참고) 바디우는 이러한 주장들에 맞서 새롭게 철학을 사유하고자 합니다. 확실히 근대에 대한 비판은 강력합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주체와 대상의 변증법에 의해 움직이는 일자의 형이상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우는 철학을 움츠려들게 하는 그 비판의 결론, 철학의 종말이라는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철학은 그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겠지요. 그러나 철학을 포기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우는 그 비판을 수용하는 동시에 철학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철학에 대한 비판과 마주해 바디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철학을 사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와 주체라는 철학적 범주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대철학 비판의 맹공으로 빈사 상태에 놓인 진리와 주체라는 낡은 철학적 범주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합니다. (p279-280)
381, 2, 3
존재의 진리와 진리생산 절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디우의 진리란 역시 존재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디우는 분명 존재론에서 출발하여 진리의 생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진리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디우 철학이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존재를 다수로 파악합니다. 그의 방법은 전통철학을 관통하는 일자와 다수의 대립을 다수의 우위를 결단함으로써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다수성은 일자를 어떤 작용을 통해 성립하는 것으로만 남겨둡니다. 예컨대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존재는 어떤 규정성을 통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수를 일자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L'être et l'événement, p. 31) 모든 지식과 법칙의 틀은 이러한 일자화하는 작용을 통해 성립합니다. 결국 지식의 체계를 이루는 백과사전적 지식들은 모두 일자화된 존재의 현시를 다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존재가 이러저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수는 우리의 세계에 현시되는 순간 일자화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존재 그 자체는 일자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수이며, 비일관적이며 불안정합니다.(L'être et l'événement, p.38) 우리가 존재를 무엇이라 규정한다 해도, 존재의 모든 게 그 규정을 통해 설명되는 것은 아니겠죠. 존재에는 항상 규정된 것의 바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러한 존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수 존재를 일자로 지칭하는 일자화의 작용은 항상 존재의 다수성을 억압하며, 다수성을 탈각시킬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존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존재를 일관적으로 지칭하는 순간, 존재의 다수성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다수성을 가진 존재를 일자로 지칭하는 순간, 그 존재는 일자로 간주됩니다. 다수성은 사라지기보다는 억압되고 탈각되는 것이지요. 이때 사람들은 과연 다수가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다수의 비일관성은 다수를 일관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다수를 일관적으로 지칭할 때, 다수는 다수가 아닌 일자가 되기 때문이죠. 다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p383-384)
사회·역사적 상황에서 다수를 일자화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상황의 부분집합을 다시 셈한 것으로서의 상황 상태)입니다. 결국 국가는 존재의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것을 집단으로 상대합니다. 개인을 상대할 때조차도 국가는 개인을 어떤 집단의 일부분으로 가정하죠. 국가는 항상 어떤 규정성으로 환원된 개인으로 상대합니다.(Badiou, D'un désastre obscur, Edition de l'aube, 1991, p. 46) 투표권을 갖는 유권자, 파업의 권리를 갖는 노동자(때로는 불법 파업을 일삼는 불순한 노동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자, 직장을 찾고 있는 실업자, 범법자, 잠재적인 범죄자, 경상도인, 전라도인, 충청도인 등등. 이러한 환원적 명명이 바로 일자화된 개인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명이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상도인이기 전에 한국인이며, 한국인이기 이전에 동양인이고, 그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무엇으로 규정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는 거대한 일자로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특정한 술어로 묶습니다. 모든 술어적 표현이 포함관계를 드러낸다고 볼 때, 국가는 이러한 술어들을 관리하는 체제인 것입니다. (p385)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동원하는 모든 법(칙)적 질서는 존재를 일자화시켜 관리하지만 그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자화의 통제가 존재의 모든 것을 억압할 수는 없겠죠. 이따금 그러한 국가의 통제는 벽에 부딪힙니다. 존재의 억압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국가의 통제는 교란되고, 그 법칙이 무력화되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디우가 말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존재의 억압된 모습이 드러나는 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성립하는 다수, 사건과 연결된 새로운 다수의 윤곽을 '진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유적인 모습, 다시 말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모습, 지식으로 식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진리는 상 황을 지배하는 법칙성의 총체인 지식 체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체 모를 것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의해 식별될 수 없고, 명명할 수 없으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원초적인 존재의 모습, 일자화를 통해 억압되고 괄호 쳐진 존재의 모습입니다. 주체란 이러한 진리의 사건에 충실함으로써 '구성'되는 결과물입니다. 충실성은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이 존재들이 진리를 현실화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체는 존재로부터 나오고 그 존재의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진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바디우 철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체는 존재로 환원되지 않지만 존재로부터 나오며, 존재의 진리를 끊임없이 실천하여 상황으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진리가 갖는 모든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식별 불가능하고 명명 불가능한 진리는 비일관적 다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소진된 후 주체가 없다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겠죠. 주체가 없다면 진리의 사건은 그저 구조의 교란이라는 스쳐 지나간 에피소드로만 남을 것입 니다. 사건에 충실한 주체는 진리의 일부로서 진리를 상황에 강제하는 후사건적 실천을 행합니다. 이 실천은 전미래 futur antérieur 의 어느 시점에서 진리를 지식에 강제하고, 그 결과 진리를 이루는 새로운 다수들은 마침내 상황의 내적인 항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Badiou, L'être et Pévénement, p.377) 바로 그때, 우리는 진리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법칙성의 영역에 속하는 항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자리잡았다고 해서 진리가 곧바로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식은 진리에서 나오지만, 진리 그 자체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평등'이라는 사건적 언표가 법적인 제도 속에서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진리의 모든 것이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한한 지식은 무한한 진리의 일부만을 받아들인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우가 내세우는 진리와 주체의 관념은 근대철학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근대철학 비판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는 철학의 또 다른 대답이며, 존재론의 쇄신을 통해 철학을 복권시키려는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을 통해 철학은 다시 진리를 사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바디우는 특정 영역에서 드러나는 특권화된 진리를 배제한 채, 진리의 변전을 다릅니다. (p386-387)
바디우에게 진리가 '도래'하는 것이라면 그 진리는 응당 복수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가 도래하는 장소, 진리를 생산해내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진리를 생산하는 영역은 철학이 아닌 철학 외부에 있습니다. 분명 철학의 중심 테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부정했을 때, 철학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철학이 진리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 외부에서 생산되어 철학에 의해 사유되는 것입니다. 바디우는 진리가 발생하는 철학 외적인 영역을 네 가지로 설정합니다. 정치, 과학, 예술, 사랑이 바로 그것인데, 바디우는 이 네가 지 영역을 진리 (생산)의 유적 절차들 procédures génériques des vérités 이라고 부릅니다.(Badiou, Manifeste pour la philosophie, pp. 13~20; 번역본, 51~59쪽) 이 절차들은 진리가 생산되는 영역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왜 이 네 가지 영역만으로 진리생산을 한정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의적인 한정이 아닙니다. 바디우는 철학사의 전개 속에서 항상 문제시되어왔던 영역을 그 절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과학은 철학사 속에서 항상 철학을 추동해왔던 동력이었고, 예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하이데거와 그 후예들에 이르기까지 철학에 긴장을 조성해왔으며, 사랑은 플라톤의 손에서 사유로 상승하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또한 오늘날 레비나스는 사랑의 철학자입니다) 누락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학이죠. 이 절차는 한때 탁월한 진리생산 절차로 기능했지만, 신이 죽어버린 오늘날 더 이상 진리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디우는 이 절차를 진리생산 절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가 더 이상 어떤 새로움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절차는 진리의 현대적 지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이 네 가지 절차에 의해 조건지어집니다. 결국 철학은 조건들에 의존하는 철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징적인 것은 이 조건들 사이에는 위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바디우의 의도는 이 네 가지 절차 중 하나 또는 일부에 진리생산의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그것들을 공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그러했듯, 철학은 이 네 가지 절차를 동시에 사유해야 하고, 동시에 플라톤에 반대해 이러한 사유의 영역을 ���렴하는 초월적 일자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바디우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388-389)
앞서 말했듯 철학은 진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철학의 임무는 네 가지 절차에서 생산된 진리를 진리로서 사유하는 일입니다. 사실 진리생산의 절차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유 활동을 전개할 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에 대한 관심은 철학에 고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은 진리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유 활동이지만, 그 진리는 철학 외부에서 생산됩니다. 철학은 그렇게 자신의 밖에서 생산된 진리를 사유할 뿐입니다. 또한 그 조건, 즉 진리를 생산하는 네 가지 절차에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그러한 네 가지 진리생산 절차들로 이루어진 철학의 '조건들'은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진리는 단독적인 singulier 것으로 어느 다른 조건에서 생산된 진리로 환원되거나, 그것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디우 철학이 함축하는 철학사 비판이 드러납니다. 그동안의 철학은 네 가지 절차 중 하나 또는 일부에만 진리생산의 특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절차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축소시켰다고 바디우는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철학의 양상을 봉합 suture 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합니다. 예컨대 과학적 실증주의는 철학을 과학에 봉합시켜 다른 조건들을 축소시켰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철학을 과학과 정치에 이중으로 봉합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하이데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인 오늘날의 철학은 시 (그리고 예술)에 봉합되어 있습니다. 바디우의 목적은 이러한 봉합에 대항하여 철학을 탈 - 봉합dé-suture 시키는 것입니다.(Manifeste pour la philosophie, pp. 41~48; 번역본, 93~100쪽) 결국 바디우가 제안하는 네 가지 진리생산 절차(철학의 조건)의 공존은 그러한 탈-봉합을 겨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철학의 윤리에 해당합니다. 철학이 탈-봉합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진리의 복수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지위를 특권화시키는 일을 막아내는 최초의 원칙입니다. 진리가 공가능 compossible 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 다수의 절차에서 각각 진리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철학은 더 이상 어느 하나의 진리 생산 절차를 '진리의 원천'으로 특권화시킬 수 없게 되고 하나의 진리에 의한 다른 진리의 지배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인정하면서 그것의 실체화를 막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바디우의 손에서 진리는 고전 철학과 전혀 다른 형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독단의 위험을 흩어버리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p389-390)
392
바디우를 비롯한 68혁명의 계승자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68년 이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여러 혁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거의 같았습니다. 68혁명은 모든 제도권 정치, 이른바 의회주의 정치에 반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산당과 같은 좌파 정당을 대안으로 삼지도 않았고, 의회 제도를 통해 해결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치는 국가와 국가의 제도에 철저히 적대적인 혁명이었습니다. 68혁명과 그 이후의 모든 정치적 대중운동은 국가적인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었죠. 모든 국가적 제도와 단절하는 것, 그리하여 국가와 의회의 독점적 민주주의가 아닌 대중의 직접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디우의 정치적 사유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68혁명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치적 유산이 있다면, 그리하여 오늘날 그 혁명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와 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제도적 정치를 배제하는 대중의 민주주의,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의 관건은 국가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Badiou, Abrégé de métapolitique, Seuil, 1998, p. 100) (p393-394)
바디우가 볼 때 68혁명이 제기하는 정치적 대안은 '당 없는 정치'입니다. 제도권 정치 정당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와 관료제에 대한 혐오, 권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적 실천, 제도권 좌파 정치와의 거리두기. 이 모든 것은 68혁명이 우리에게 남겨 놓은 정치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68혁명의 유산은 대중의 직접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상상력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실천 속에서 그 형태를 창안하기를 요구합니다. 바디우에 따르면 그 시작은 우선 제도적 정치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좌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도권의 좌파란 대중운동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여 집권에 이용하는 집단일 뿐입니다.(Badiou, La Commune de Paris, Les conférences du Rouge-Gorge, 2003, p.16) 의회정치에서 '진정한 좌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디우는 좌파를 선거에서의 구분을 제외하면 우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정치 집단으로 간주합니다. (p395)
바디우가 주창하는 정치적 원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대안 정치란 어떤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자 정치, 농민 정치, 페미니즘 정치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정체성�� 근거로 성립된 정치이며, 그 근거가 사라질 때 주체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허약한 정치입니다. 바디우의 사유에 따르면 오늘의 정치적 과제는 국가와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갈라놓은 격자 체계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만인의 민주주의라는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중의 민주주의란 어떤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근거하는 정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대중은 계급이나 특정 집단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중'과 같은 새로운 집단 또한 아닙니다. 대중은 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 어떠한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규정성에서도 벗어난 무한한 가능성인 것입니다. 이 대중의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힘은 '평등'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객관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원칙들입이다. 그것은 선언적 가치를 지니는 정치적 원칙들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선언, 다시 말해 평등의 선언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우리를 돌려 세울 정치적 원칙들인 것입니다. (p396)
397-8
어떻게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디우에 따르면 그것은 '용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진리를 받아들인 주체가 지녀야할 덕목입니다. 플라톤이 《라케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기란 용기 있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용기 있는 영웅적 행위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용기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바디우는 용기를 현실의 시련에 마주하여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Badiou, De quoi Sarkozy est-il le nom, pp.97~100) 그것은 계속해서 용기를 갖는 것이고, 쉽게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때, 그 공포에서 빠져나가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무기력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용기를 통해 진리의 흔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시작하여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중항쟁으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정치적 사건들을 이어가는 것이 그 용기의 출발점이 되고, 지난 민주화 10년의 굴곡과 오늘날의 무력함이 인내의 용기를 통해 극복될 때, 그 용기는 비로소 다음 사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주체가 갖는 인내의 용기야말로 세계의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진리의 정치'의 규정일 것입니다. (p399)
(400-1)
철학아카데미 , '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 ' 중에서
0 notes
Text
더넌2 넷플릭스 무료보기 ott 자막 the nun 2
더넌2 넷플릭스 무료보기 ott 자막 the nun 2 보세요.
더넌2 넷플릭스 무료보기 ott 자막 the nun 2 링크 <
누누 티비 아니니깐 안심하고 보세요. 영화 더넌1 ott, 더넌2 무료 보기 넷플릭스 후기 긍정적이고 더넌3도 나올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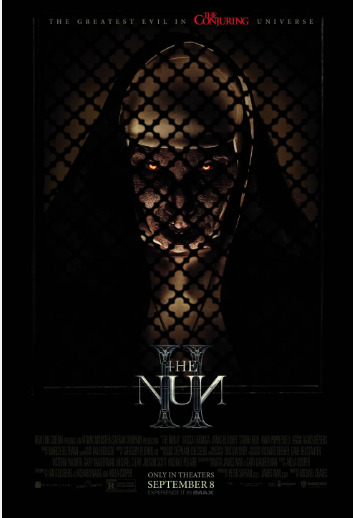
더넌2 넷플릭스 무료보기 ott 자막 the nun 2 1956년 프랑스, 한 성당에서 신부가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이린 수녀(타이사 파미가 분)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그녀는 4년 전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악마 발락의 기운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사건의 배후에 발락이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아이린 수녀는 성당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조사하며, 점차 발락의 존재와 그 음모에 대해 파악하게 됩니다.
주요 등장인물 아이린 수녀: 주인공으로, 깊은 신앙심과 용기를 지닌 인물입니다. 4년 전 발락과의 대결 이후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발락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발락을 물리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모리스: 아이린 수녀의 조력자로, 발락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과거와 연결된 깊은 비밀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영화의 중요한 전개를 이끄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모리스의 캐릭터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아이린 수녀와 함께 성장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발락: 영화의 주요 악당으로,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 끊임없이 공포를 조성합니다. 발락은 성당과 그 주변 인물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합니다. 그의 등장 장면은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관객들에게 공포의 정점을 경험하게 합니다.
영화의 전개와 주요 사건 영화는 성당에서 발생한 신부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아이린 수녀와 모리스가 성당을 조사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들은 성당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들과 발락의 존재에 대해 점차 알아가게 됩니다.
성당 조사: 아이린 수녀와 모리스는 성당 내부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발락의 과거와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를 파헤칩니다. 성당 내부에는 다양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발락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발락의 계략: 발락은 끊임없이 아이린 수녀와 모리스를 시험하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발락의 계략은 단순한 물리적 위협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며, 관객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선사합니다. 그의 존재는 영화 내내 긴장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클라이맥스와 결말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성당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아이린 수녀와 모리스는 발락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며, 그동안 밝혀낸 단서들을 바��으로 발락을 물리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용기를 시험받게 되며, 각자의 내면에서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결말에서는 발락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린 수녀는 자신의 신앙과 용기를 바탕으로 발락을 물리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영화는 단순한 공포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엔딩을 선사합니다.
영화의 테마와 메시지 "더 넌 2"는 종교적 테마와 함께 신앙과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이린 수녀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악마와 싸우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싸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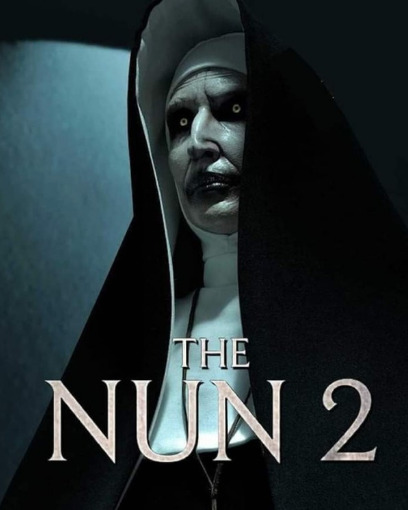
더넌2 넷플릭스 무료보기 ott 자막 the nun 2 또한, 영화는 공포 영화로서의 장르적 요소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캐릭터들의 감정선과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깊이를 가지며, 관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술적 요소와 연출 "더 넌 2"는 기술적 요소와 연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딕 양식의 성당과 그 주변의 음산한 분위기를 잘 살린 촬영 기법은 영화의 공포감을 극대화합니다. 어둠 속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발락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사운드 디자인과 음악 역시 영화의 분위기를 한층 더 음산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포 장면에서의 적절한 음악 사용과 효과음은 관객들을 공포의 세계로 몰입하게 하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컨저링 유니버스"와의 연관성 "더 넌 2"는 "컨저링 유니버스"의 일환으로, 이전 작품들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넌" 영화와 "컨저링 2"에서 발락의 등장은 이번 영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리즈 팬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단순히 이야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영화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더 큰 스토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하나의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체 시리즈를 통해 더 큰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더넌2 넷플릭스 무료보기 ott 자막 the nun 2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강렬한 공포 장면들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아이린 수녀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는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컨저링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공포 영화 팬들뿐만 아니라, 컨저링 유니버스의 팬들에게도 큰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와 깊이 있는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공포 경험을 선사하며, 앞으로의 컨저링 유니버스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더 넌 2"는 공포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작품으로 남을 것입니다.
1 note
·
View note
Text
위로에 관련된 속담 ⭕️
위로에 관련된 속담 1. "The darkest hour has only sixty minutes." - Morris Mandel 가장 어두운 시간도 60분 밖에 없다. - 모리스 맨델 2. "After a storm comes a calm." - Matthew Henry 폭풍이 지나면 평온이 온다. - 매튜 헨리 3. "This too shall pass." - Persian Proverb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 페르시아 속담 4.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 John Milton 모든 구름에는 은빛 빛깔이 있다. - 존 밀턴 5. "Tough times don't last, tough people do." - Gregory Peck 어려운 시기는 영원하지 않..
2024. 6. 11.
0 notes
Text
Bee Gees
youtube
애플뮤직에서 70's 플레이리스트를 들었는데, 가장 첫 곡이었다, Bee Gees를 여타 플레이리스트, 스테이션에서 여러번 접해보았지만, 갑자기 신선하게 다가와서 이 밴드에 대해 서치해보았다.
우선 Bee Gees눈 70년대 디스코의 상징적인 밴드로 불려진다.
Bee Gees는 호주에서 결성하고 영국에서 활동한 배리 깁, 로빈 깁, 모리스 깁 3형제가 결성한 밴드이다. 이들의 음악은 마이너 장르에 불과했던 디스코를 단숨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장르로 변화시켰고 AC/DC와 함께 호주 출신이지만 큰 인기를 끌며 호주를 음악 강대국으로 변화시켰다. (실제로 이들의 인기는 1997년 브라이언 윌슨이 로큰롤 명예의 전당 시상 연설 중, "Only Elvis Presley, the Beatles, Michael Jackson, Garth Brooks and Paul McCartney have outsold the Bee Gees."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이 곡은 70년대 뉴욕을 가사에 담아냈다고.
+서치하다가 알게 된 Stayin' Alive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심폐 소생술 시전 시, 박자가 104BPM이라서 리듬을 맞추기 좋은 노래로 선정되기도 했더란다.
youtube
이 곡은 Stayin' Alive 보다 조회수가 약 3억 뷰가 더 많았다. 디스코 장르랑은 조금 거리가 먼 느낌. 80년대 로맨스 영화 ost를 듣는 것 같기도 하���.. 유튜브 댓글에서 "Classic"이라는 말을 써서 이 노래를 표현한다.
내 마음에 쏙 들어왔던 디스코 말고도 발라드/포크/블루스/팝/컨트리/록 등.. 대중음악으로 여겨지는 거의 모든 장르를 망라한 밴드.



셋의 구도가 재밌어서..
0 notes
Video
프랑소아 모리스 모나코 Monaco 4K Jean Francois Maurice 28°A L ombre 4K HIGH FR30 명...
0 notes
Text
쟝 프랑소아 모리스 -모나코 (Jean Francois Maurice-28°A L'ombre)
youtube




1 note
·
View note
Text
쟝 프랑소아 모리스 -모나코 (Jean Francois Maurice-28°A L'ombre)
youtube


New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시장 서문시장 뿐 아니라 여기 올리비앙 승무원이 아닌 분이 어딨어요 시장에서 정화조도 안빼고 수년째 궁상맞게 식사하시면 뇌졸중 옵니다
우리가족들 서울특별시 떼어 왔잖아요 거기 북반구 우린 남반구 다 알면서 호텔은 뭘로 예식을 합니까 예식이 없으면 뷔폐는 재료가 없어서요 랍니다 예수님 굶어 죽어 피에타 만드시게요 중앙성당에 계시는데
이러니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귀 돈 밖에 더 들어갑니까 난 궁상 맞는거 싫어 합니다 아버지들 파일럿 생각도 좀 해주세요 당신 처녀때 참 이뻤는데 하시잖아요

돈이 원수 사탄 마귀 입니다 그 힘든 일을 또 우리가 해냅니다 뭐 예산이 17조 7,000억원에 더블 정도 쏘리 내가 주범이지롱 공항 다녀오면 경신 *이월 해피뉴이어 새해인데 공책에 2025년 1년이면 자그만치 얼마야
KBS 는 재난방송 입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 전국 타전 재난지원금 지급 하세요 증빙 로또 수혜자 같이 냉동만두 되자 이거네 돈 돈 돈 하잖아 지금 개인을 개별로 개별을 과세로 과세를 신탁 저축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정부채가 심각해집니다 흑흑흑
어디 가난이 주는 고통의 신비 안하나 보자 KBS


2 notes
·
View notes
Text
youtube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 마일즈 데이비스"
어제 윤두환이 TV에 나와 아무말 지껄였다는데, 혈압 오를 거 같아 시청은 못하겠고 요약을 보던 중 문득 떠오른 영화 제목.
"사형대의 엘리베이터(=Ascenseur pour l'échafaud)". 1958년 개봉한 프랑스 누아르 영화. 루이 말 감독, 잔 모로, 모리스 로네 주연.
비디오 대여점이 성업 중이던 시절, 내가 살던 동네에도 있었다. 뭔 내용이었는진 당연히 가물가물하고 누아르 장르인 만큼 어둡고, 우울했던 인상만. 내가 이 작품에 관심을 둔 이유는 마일즈 데이비스가 음악을 담당했기 때문.
그는 1949년 처음 파리를 방문했는데, 자서전에서 이 시기를 특별한 시간으로 다뤘다. 첫째, 태어나 처음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를 경험했다고 한다. 둘째, '파리의 하늘 아래(=Sous le Ciel de Paris)'를 부른 여가수 줄리엣 그레코와 만나 연인이 된다. 셋째, '사형대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처음 영화 제작에 관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럽 여행에서 처음 만끽한 자유, 연애, 다시 미국에 돌아온 후 상실감으로 인해 처음 마약을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헤로인에 빠져든 마일즈는 3년여 세월을 낭비했다. 이로 인해 스스로 파멸해 감을 느꼈는지 아버지 소유한 농장에 있던 집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금단 증상을 견뎌냈다고 한다. 아래에 자서전 일부를 인용.
"…농장에는 방 두 개짜리 객실이 있었고 내가 갈 곳은 거기였다. 나는 문을 잠그고 금단현상이 멎을 때까지 버텼다…중략… 약을 떨쳐 버리려는 몸이 엄청 아팠다. 온몸이 안 좋았다. 목과 다리, 온몸의 관절이 완전히 뻣뻣해졌다. 꼭 관절염이 걸린 것 같았고, 지독한 독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은 기분이었다. 그 느낌은 묘사가 불가능하다. 관절이 있는 대로 욱신거리고 뻣뻣해졌지만 만질 수가 없다. 만지면 비명을 지르게 된다…중략…꼭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고 누군가 2초 후에 죽으라고 하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이었다…중략… 나중에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무의식 상태에 빠지려고까지 했다. (내가 있는 곳은 2층이었다.) 다행히 다리만 부러져서 땅바닥에 누워 아픔을 호소하게 되었지만. 이런 상태가 7일 내지는 8일 동안 계속되었다…중략… 그러더니 하루는 이런 현상이 멈췄다. 마침내 끝난 것이다…"
예전에 음악 동호회에서 활동할 당시에 대마초 피우던 인간이 있었다고 들음. 나중에 근황을 물어보니 상습범으로 감옥살이까지 했다는 미확인 소문까지. 난 위 글을 읽고 마약은 호기심에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찰리파커, 빌리 홀리데이, 버드 파웰, 쳇 베이커, 스탄 게츠, 빌 에반스 등등… 재즈, 롹 뮤지션 중에는 이거 때문에 파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0 notes
Text

👌[갤러리아] 닥스침구고밀도 모리스[9온스] 퀸세트[퀼트이불+패드+베개커버2장]👌
🍰 주문하기 🏹클릭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제휴활동의 일환으로,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가격비교는 물론 다양한 상품후기를 참고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메신저(쪽지)와 DM은 못읽어요ㅠㅠ
0 notes
Text
쟝 프랑소아 모리스 -모나코 (Jean Francois Maurice-28°A L'ombre)
youtube




News
중국 🇨🇳 공산당 당 서열 3위 시진핑 집���3기에 정권퇴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CCTV 돼지다
말로만 떠들지 하는 행동이 없다 가 시진핑 집권1기 로 바뀌는 원인이다
승무원들을 올리비앙 이라고 합니다 고객응대 3년상 중 처리 개판 국제법상 손해배상에 따라 직위 해임됨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만 맞는 소리다
등이 갈래 난 갔다왔어 하얀 눈이 내렸지 때려쳐


0 notes
Text
⌓ Click on the letters for more details. 글자를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 - Φ - Δ - Σ - Ψ - Ω
PROGRAM Α: Opening Films 개막
2024 Oct 25 (Fri), 18:00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is the most immediate reflection of all human relationships." - Karl Marx
The film begins with the phrase, 'Where does your hidden smile lie,' which will become the title of Pedro Costa’s documentary recording the editing process of Sicilia! (1999), a film made by Danièle Huillet and Jean-Marie Straub, who lived and made films together for over 40 years. From Today Until Tomorrow is a film adaptation of an opera composed by Schönberg, which tells the story of "modern" married life. The opera is based on lyrics by Max Blonda, the pseudonym of Gertrud Kolisch, Schönberg's partner. Imagine the filming site where the entire film was shot in sequence with synchronized sound on a three-walled stage set, where the Radio-Sinfonie-Orchester Frankfurt, led by Michael Gielen, and the crew, including cinematographer William Lubtchansky, move whenever the scene changes. In another film adaptation of Schönberg's unfinished opera, Moses and Aaron (1974), for which Gielen also conducted the score, they filmed not on a set but outdoors in Egypt and Italy, using color film. In all their music films, including their first feature The Chronicle of Anna Magdalena Bach (1967), which recounted the lives of Anna Magdalena and her husband Johann Sebastian Bach in collaboration with Gustav Leonhardt, Huillet and Straub painstakingly adhered to shooting in sequence.
Meanwhile, Lothringen!, released together with From Today Until Tomorrow, is based on part of Maurice Barrès' 1909 novel Colette Baudoche. Although Barrès hailed from Alsace-Lorraine, like Huillet and Straub, he was widely known as a nationalist, unlike the self-declared communists Huillet and Straub. The film opens with a long panning shot that shows the statue of Kaiser Wilhelm I overlooking the Rhine and Moselle Rivers, the battleground of the 1871 Battle of Sedan in Koblenz, the Resistance memorial, the iron mines of Metz, coveted by both Germany and France, and cemeteries – all landscapes filmed in Lorraine in June 1994. In this setting, Colette Baudoche, the character in Huillet and Straub’s film, says “No” to a German suitor, but her ‘present’ is not the late 19th century; it’s right after the European Parliament in Strasbourg, the capital of Alsace-Lorraine, declared the founding of the EU.
Along with these two films, the opening film Wind From Nowhere (2024) raises curiosity about how its floating camera and characters will inherit or reject the (ana)chronism and (a)topos of Huillet and Straub. (SHIN Eun-shil)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를 반영하는 가장 즉각적인 관계다.” -카를 마르크스
40년 넘게 함께 살며 함께 영화를 만든 다니엘 위예와 장마리 스트로브의 〈시칠리아!〉(1999) 편집 과정을 기록한 페드로 코스타의 다큐멘터리 표제가 될 문구, “당신의 숨겨진 미소는 어디에”라는 제사가 영화를 연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쇤베르크가 "현대"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는 막스 블론다(쇤베르크의 반려자였던 게르트루트 콜리쉬의 필명)의 가사에 기초하여 작곡한 오페라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삼면 세트에서 철저히 순서대로 촬영하여 전편을 동시녹음으로 제작한 현장에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미카엘 길렌의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교향악단과 촬영감독 윌리암 뤼브샹스키를 비롯한 스태프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다른 쇤베르크의 미완성 오페라를 영화로 옮기며 역시 길렌이 음악 감독을 맡았으나 세트가 아니라 이집트·이탈리아 야외에서 컬러 필름으로 찍었던 〈모세와 아론〉(1974),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와 협업하여 안나 막달레나와 그의 남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삶을 복기한 첫 장편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연대기〉(1967) 등 자신들의 모든 음악 영화에서, 위예와 스트로브는 엄청난 수고를 감수하며 순서 촬영을 고수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와 묶어 개봉한 〈로트링겐!〉은, 스트로브와 동향인 알자스로렌 지방 출신이지만 자타 공인 공산주의자였던 위예·스트로브와 달리 우익 민족주의 인사로 널리 알려진 모리스 바레즈의 소설 『콜레트 보도슈』(1909) 일부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긴 패닝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라인과 모젤강을 굽어보는 프로이센 황제 빌헬름 1세의 동상, 1871년 세당 전투의 격전지 코블렌츠 전경, 레지스탕스 희생자 위령탑, 독일과 프랑스 모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메츠의 철광, 묘지 등 1994년 6월의 로렌에서 촬영한 풍경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독일인의 청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위예·스트로브 영화 속 콜레트 보도슈의 ‘오늘’은 19세기 말이 아니라, 알자스로렌의 주도 스트라스부르에 설치된 유럽의회가 EU 출범을 공포한 직후였던 게다.
이 두 작품과 더불어 개막작으로 상영되는 〈기원 없는 바람〉(2024) 속 부유하는 카메라와 인물들이 위예와 스트로브의 (아나)크로니즘과 (아)토포스를 어떻게 계승하고 어찌 거부할지, 자못 궁금하다. (신은실)

Lothringen! 로트링겐!
Jean-Marie Straub & Danièle Huillet 장마리 스트로브 & 다니엘 위예
Germany, France | 1994 | Color | Sound | 35mm (digital projection) | 22’
⌔ more info

Von heute auf morgen 오늘부터 내일까지
Jean-Marie Straub & Danièle Huillet 장마리 스트로브 & 다니엘 위예
Germany, France | 1997 | B&W | Sound | 35mm (digital projection) | 63’
⌔ more info

Wind from Nowhere 기원 없는 바람
Il-hwan & Han Chae Yeon 일환 & 한채연
South Korea | 2024 | Color + B&W | Sound | Digital | 27'
⌔ more info
0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