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
Explore tagged Tumblr posts
Text
청소기 청소하려는데 일자 드라이버가 없어서 가장 비슷한 칼날 가지고 힘줘서 돌리다가 왼손을 찌르고 말았다. 비명 지를새도 없었다. 욕실 바닥과 손바닥에 새빨갛게 번지는 피를 보고 서둘러 두루마리 휴지를 두툼히 끊어 왼손으로 쥐었다. 그리곤 바닥의 핏자국을 물로 씻어내고 한참동안 뭉근한 통증을 느끼고 서 있었다. 병원에 가야하나. 꼬매야 할 것 같은데. 통증이 꽤 심하네. 찌른걸까 옆으로 그은걸까. 피로 보면 찌른 것 같은데. 오른손이 아니어서 다행이네. 하던거나 마저하자. 왼손은 휴지뭉텅이를 쥐어잡고 오른손으로 풀다만 나사를 천천히 빼내 분리를 해내고 더러워진 부분을 칫솔과 샤워기로 꼼꼼히 씻어냈다. 왼손의 휴지가 빨갛게 변하는 걸 보니 이거말고 다른 일은 하지말고 일단 지혈부터 시켜야할 것 같아 햇볕잘드는 창가에 씻은 청소기 부품을 가져다 놓고 소파에 앉았다. 병원을 가야하나. 몇바늘 꼬매야할텐데. 파상풍? 에이 집에 있던 물건인데 그건 걱정안해도 되고. 영화보면 찔리고 베이고 해도 잘만 살던데 뭐 요까짓거 찔린걸로 병원엘. 난 내 혈소판과 백혈구들을 믿으니까. 삼십분쯤 지나 피가 안나는걸 보고 휴지를 떼어봤는데 상처의 모양을 보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찌르고 긋고를 다 했단 걸 알았다. 숨은 칼잡이가 나였다니. 꼬매야 붙을 상처였다. 아 귀찮은데. 오염되었을 상처부위부터 씻자 싶어 세면대에 손세정제를 붓고 물로 거품낸뒤 왼손을 담가 몇번 휘저었다. 통증이 다시 느껴진다. 흐르는 물에 비눗물을 씻고 다시 상처를 보니 피가 새어나온다. 깨끗한 거즈로 다시 쥐어잡고 지혈되면 아.. 이럴때는 분말형 마데카솔이 최곤데. 그냥 연고형으로 바르고 최대한 자주 소독하고 바르고 그래야겠다 생각했다. 손바닥이라 잘 안붙게 생겼다. 자꾸 움직이니 상처가 벌어져서 안될 것 같아 마지막 드레싱 후 잠자기 전 거즈손에 붕대까지 감아주었다. 밤새 새살이 많이 차 오르길 기도하며.. 지금 피는 멎었고 전체 상처부위는 자로 재 보니 2센티이고 한 2mm정도 빼고 나머진 다 붙었다. 구멍같기도 하고 동���지갑같기도 한 2mm의 상처도 곧 차오를 것 같아 보인다. 아싸 돈 굳었다. 근데 아침청소 후에 일어난 일이라 결국 어제 하루종일 씻을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하루종일 집안에만 있어야 했고 그래서 결국 삼시세끼 다 챙겨먹고 영화만 보다 오늘 앉아있기 힘들정도의 뱃살을 느끼는 중이다. 아 오늘은 퇴근하고 뛰어야지 했는데 망할 비가오네..
20 notes
·
View notes
Text
"우두커니"
*우두커니
서른의 중반즈음이 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남들은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는데 나만 우두커니 남겨지는 건 아닐까.
이사람도 저사람도 선택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나는 줄곧 뒤쳐지고 있는 기분이 든다.
마음껏 즐기지 않았던 시간은 딱히 없었다.
그렇지만 후회했던 시간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은 가득히 넘치는 줄 알았는데 덧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된통 늙어버린 기분에 묘한 세월이 갑자기 쏟아진다.
방 한 켠에 우두커니 앉아서 그런 생각들을 고르고 있자면 한없이 작아지는 내가 얼마나 우스운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척 하면서도, 어긋나 살아가기도, 또 결국 돌아나가기도 하고 그런 어리숙한 존재로 남는다.
결국엔.
-Ram
*우두커니
'요즘엔'이라는 표현이 조금 무색하긴 하지만, 요즘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고, 움직여야 할 일들이 참 많다. 언제 마지막으로 우두커니 있었는지 떠올려보니 혼자 태국에 있었을 때였나. 그때도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눈이고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다. 갑자기 떠오른 건 약 18년 전 체육시간. 가만히 있는 건 너무 싫은데,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우두커니 스탠드에 서 있던 그 짧은 시간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다. 일분일초가 한 달, 1년과도 같았던 그 시간들이. 그 이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우두커니 놓여져 있는 자체를 싫어했었을 지도 모른다. 자꾸 무언가를 만들고, 생각하고, 집중하려 하고, 이야기하려 한다.
-Hee
*우두커니
이른 새벽인데도 이미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체온을 조금 올린 뒤 출발선 뒤로 가서 설 때 긴장���은 희열로 변질된다. 원하는 만큼 몸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이전의 노력이나 사정과는 관계없이 나의 현재를 검증받는 시간. 출발선에 서면 늘 부상 없이 완주만 해보자고 다짐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전의 나보다는 조금 더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솟았다.
대회 초반부터 시작된 오르막에서 병목현상으로 사람들이 멈춰 섰다. 초반부터 힘껏 달려나갈 땐 언제고, 이렇게 걸어서 갈 거면 뒤에서 출발해서 여유롭게 가지… 힘들어서 걷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기록을 생각하니 울지도 웃지도 못할 상황이었다. 천천히 오르막을 오르던 행렬이 이내 완전히 멈춰 서버렸다. 오늘 오후쯤 지나가게 될 산허리 위로 붉은 해가 뜨고 있었다. 매일 뜨는 일출이 뭐라고 누구랄 것 없이 멈춰 서서 바라볼 일인가 싶었지만 나도 별수 없이 떠오르는 해를 우두커니 바라봤다.
최소한의 집착도 내려두고 나만의 레이스를 하자고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높게 뻗은 나무가 만들어내는 짙은 그늘. 어제 내린 비에 젖은 숲의 냄새.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달려서는 자연도 대회도 무엇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노력은 단순한 기록으로만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나만의 레이스를 펼치며 체력을 완전히 소모한 뒤에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들을 내 안에 한가득 채워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Ho
*우두커니
우두커니 서있었 적이 언젠가? 요즘은 어디든 종종걸음으로 바쁘게 다녀서 멍 때릴 시간도 없는 것 같다.
잠깐도 밖에 서있기 힘든 여름이 온다. 이번 여름은 서핑을 배우고 싶고, 바다에 많이 가고 싶고, 뱃살을 조금이라도 빼고 싶고, 책을 3권정도는 읽고 싶고, 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인이
48 notes
·
View notes
Text
아직 무사해.
거대하고 육중한 칼이 허공에서 나를 겨눈 것 같은 전율 속에서, 눈을 부릅뜸으로써 그 벌판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은 채 나는 생각했다.
비탈진 능선부터 산머리까지 심겨 있는 위쪽의 나무들은 무사하다. 밀물이 그곳까지 밀고 올라갈 순 없으니까. 그 나무들 뒤의 무덤들도 무사하다. 바다가 거기까지 차오를 리는 없으니까. 거기 묻힌 수백 사람의 흰 뼈들은 깨끗이, 서늘하게 말라 있다. 그것들까지 바다가 휩쓸어갈 순 없으니까. 밑동이 젖지도, 썩어들어가지도 않은 검은 나무들이 눈을 맞으며 거기 서 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내리는 눈을.
그때 알았다.
파도가 휩쓸어가버린 저 아래의 뼈들을 등지고 가야 한다. 무릎까지 퍼렇게 차오른 물을 가르며 걸어서, 더 늦기 전에 능선으로,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고, 누구의 도움도 믿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등성이 끝까지. 거기, 가장 높은 곳에 박힌 나무들 위로 부스러지는 흰 결정들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단지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하길 원한다면.
삶을.
(26~27쪽)
창밖 박명이 완전히 사라졌다. 푸르스름한 잿빛을 ���금고 낙하하던 눈송이들이 ���이상 보이지 않았다. 간밤 내가 아마를 묻었고 여러 달 전 인선이 아미를 묻은 나무도 칠흑 같은 어둠에 지워졌다.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헝겊들이 서로 스치는 것 같은, 젖은 흙덩이가 손가락 사이로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가 어디선가 새어나왔다. 인선의 것과 닮은 소리였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녀가 아니라 서울의 병실에 누운 인선이, 손이 아니라 성대를 다친 듯 목을 울리지 않으며 내던 무성음과 어딘가 흡사했다.
의자를 뒤로 밀고 나는 일어섰다. 날아오르려는 것인지 내려앉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서까래와 마루 사이에 영원히 갇힌 듯 퍼덕이는 그림자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촛불과 그림자 사이 새의 육체가 있어야 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니.
무성음들이 포개지며 한마디 말처럼 들렸다.
······아니, 아니.
환청인가, 의심하는 찰나 단어가 부스러져 흩어졌다. 헝겊 스치는 소리가 잔향을 끌고 사라졌다.
어느 사이 인선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가까워진 촛불의 빛이 눈동자에 어려서인지 갑자기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방금까지 피로한 듯 싱크대에 기대서 있던 사람 같지 않았다.
작년 가을에 내가 왔을 때······
내가 말을 뗀 순간 그 생기가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때도 아미가 저 말을 했는데.
추운 듯 인선이 두 손으로 촛불을 감쌌다. 불빛이 스며든 손들이 붉어졌다. 빛이 가려진 만큼 주변은 어두워졌다.
너한테서 배운 말이야?
모아 붙이고 있던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인선이 되물으며 촛불에서 손을 거둬들이자 한꺼번에 빠져나온 빛이 그녀의 얼굴을 밝혔다.
오래 혼자 있으며 혼잣말을 하게 되잖아.
동의를 구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선이 말을 이었다.
어떤 말을 중얼거린 다음에, 그걸 부인하려고 좀더 큰 소리로 아니라고 말하는 버릇이 생겼어.
나는 캐묻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대답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받은 듯 그녀는 신중하게 다음 말을 골랐다.
혼이 들어선 안 되는 말, 정말로 혼들이 들어줄지 모를 소원······ 그런 걸 뱉은 다음에, 종이에 쓴 걸 찢어버리듯이.
연필을 힘껏 눌러써서 종이에 자국을 남기듯 인선의 음성이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아미한테는 뒤의 말만 제대로 들렸을 거야. 내가 그렇게 우는 동물인 줄 알고 따라 했는지도 모르지.
그 소원이 뭔지 나는 묻지 않았다. 내가 아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싸우는 것. 날���다 썼다 찢는 것. 화살촉처럼 오목가슴에 박혀 있는 것.
(204~206쪽)
그후로는 엄마가 모은 자료가 없어, 삼십사 년 동안.
인선의 말을 나는 입속으로 되풀이한다. 삼십사 년.
······ 군부가 물러가고 민간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281쪽)
작별하지 않는다 - 한강
9 notes
·
View notes
Text
나는 파도가 치면 지레 겁을 먹고 모래성을 부수기 급급했다_(나의 비겁에 관하여)
나는 파도가 치는 바다에 수십년을 살아가면서도, 늘 철썩이는 파도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기 일 수였고 어느 날은 밀물에 불어나 수면을 넘어오는 그것들에 지레 겁을 먹고 내가 손 수 세웠던 모래성을 다시 내 손으로 부숴버리기 급급했다.
소중했던 것들을 잃었던 기억들을 되돌아보면, 항상 도망치는 쪽은 나였고,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다 등을 돌려 떠나버리거나, 쫓아오기에 지쳐 포기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도망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마다 나는 ‘그럼 그렇지, 저런 사람이었다니까.’ 와 같은 역겨운 자기위안에 빠진 채 스스로가 슬기로운 선택을 하였다는 고독한 안도감의 모래지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은 것은 언제였을까, 한 연예인이 몇 년 전 예능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였을 땐 정말 늦었다.’라고 농담같이 말했던 이야기가 뜬금없지만 그 깨달음과 함께 떠올랐다. 내 멍청함을 깨달은 것이 언제였든, 나는 내 손에 움켜쥐었던 모래들이 이미 제 스스로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애써 먼저 손을 펼쳐 털어버리는 짓을 반복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후이기에 결국엔 후회 섞인 비통함으로 반죽한 감옥에 스스로를 투옥할 수밖에 없었다.
웃긴 이야기는-사실 역겨운 이야기이겠지만 서도- 이런 나에게 늘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친절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내 토악질 나오는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하여 쓰고 다닌 가면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니. 처음부터 나 자신을 그렇게 가꾸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어느 망해버린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멀티버스 세계관처럼,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의 변화의 경우의 수는 무한대로 뻗어 나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자신의 변화가 긍정적일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이며, 나는 그러지 않을 수많은 삶을 리스크 체크라는 변명으로 포기했을 뿐이다. 누군가는 이 해변에 서핑샵을 열고, 파도를 타며 저녁이면 우드 향 가득한 위스키에 탄산수를 조금 타 마무리하며 깊고 안온한 잠에 들겠지만, 나는 내 선택들의 연쇄효과를 통하여 비어버린 해변에서 파도소리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스톡홀름 신드롬이 생겨버린 피해자처럼 ‘파도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도, 변화를 해보겠다고 가끔 내 해변에 모래들을 열심히 반죽하여 성을 쌓는 날들이 있다. 그럴 때면, 완성된 성의 모습을 상상을 하다, 누군가 나의 해변을 지나가다가 칭찬과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고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는 그런 미래가 있지 않을까 퍽이나 쓸데없는 망상으로 변질되고는 한다.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 남들과 비교하여도 객관적으로 불행하다고 할 만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외모와 행동으로 인한 왕따, 그로 인한 반사회적 성격 형성, 악순환처럼 이어지는 스스로의 고립까지. 하지만 분명 그 사이에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고 방어적이며 그룹활동을 철저히 거부하는 나를 교실 안으로 다시 들여준 선생님들, 집 가는 길 나를 처음 같이 PC방을 가자고 하며 끌고 가준 친구들, 기억엔 없지만 수없이 많은 호의가 나를 지나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 때의 나보다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결론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동일한-혹은 더 퇴보한-사람이지 않는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더욱이 나의 이 어두운 면을 감싸주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결국에 연락처를 바꾸거나, 타지로 도망가거나 등 다양한 이유로 그들을 끊어낸 것은 역시 나였다.
영장류는 학습을 하여 발전을 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이 수많은 사례들만 봐도 ‘나는 그 고통을 통하여 성장하고 알을 깨고 나아갔다’는 희망적인 결말을 그려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한 자리 수의 평수 단칸 방 침대에 누워 불면도 숙면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에서 시간을 버리며 살아가다 결국 서른이라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 사이에 나는 군대를 다녀왔고, 대학을 자퇴했고, 수 번의 이직을 하며 조직에 녹아들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 그렇다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괴짜 천재들처럼 비범하지도 않으며, 남들 모르게 세상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저 그런 한심한 존재로 남아있다.
이제 제법 빠르게 모래성을 지을 수 있고, 언제쯤이면 이 파도가 해수면을 넘어오는지 감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것은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래성 도면과 어디쯤에서 부수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다. 이것은 마치 삼체 문제 마냥 내가 아무리 견고한 가설을 쌓아도 무너지고 만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룬 것이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이 삶이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다. 몰디브처럼 언젠가 바다에 잠길지도, 혹은 그 전에 나의 해변에 모래가 모두 파도에 이끌려 도망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내가 얻은 하나의 교훈은,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대학교 과제로 글을 쓸 일이 생겨서, 이 축복을 담아 ��꾹 눌러 써 기고해봅니다."
20 notes
·
View notes
Text
엄마 없는 생일은 처음이라
엄마 안녕.
잘 지내? 아픈 데는 없고?
엄마가 나에게 잘 지내냐고 묻는다면 난 그렇지 못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 엄마가 떠난 날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생각이 떠올라. 근데 있잖아. 아프지 않고 건강했던 엄마의 모습이 잘 기억이 안 나.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엄마를 떠올리면, 엄마가 떠나기 전, 호스피스에 있던 모습만 떠올라. 건강했던 엄마를 생각하지 못해 미안해.
난 아직도 엄마가 호스피스에 있던 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말했듯이 온통 그때만 생각이 나고 어느 날 집에 혼자 있으면 엄마가 어디 놀러 갔거나 장 보러 간 것만 같은 느낌이야. 언제든지 현관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따 집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엄마한테 카톡으로 저녁 뭐 먹냐고 물어봐야지.’ 정도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금세 정신 차리지. 아, 엄마 이제 없지. 엄마한테 연락할 수가 없지.
얼마 전엔 내 생일이었어. 엄마 없는 생일은 처음이라 슬프기만 하더라.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도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 엄마가 힘겹게 낳아서 기쁜 날일 텐데 슬퍼하기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모두가 축하해줘서 괜찮았던 것 같아.
생일 전날에 엄마를 보러 갔는데 날이 너무 덥더라. 가만히 서 있는데도 땀이 흐르더라고. 그래서 얼마 못 있다 왔어. 미안해. 곧 또 갈 테니까 그때는 오래 있다 갈게. 그래도 햇빛은 잘 들어오더라. 겨울엔 엄마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어쩐지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생각이 났어. 원체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인지라 아침에 끓여주면 저녁에 와서 먹곤 했는데 이번 생일은 어쩐 일인지 아침이 먹고 싶더라고. 아마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런 거겠지.
생일이라고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살았던 것도 아닌데 이번 생일은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어쩌면 그동안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고마움에 대한 후회인 것만 같아. 유독 더 많이 생각나는 날이었어.
자꾸 쓰다 보니 ‘~같아.’로 끝내게 되네. 그건 더 이상 엄마한테 직접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엄마, 우리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늘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여러 가지를 더 해보지 못한 후회일 거야. 엄마가 우리랑 살면서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부디 행복했다고, 일찍 떠나지만 잘 살았다고 생각하기를 바라. 나는, 우리는 엄마랑 살면서, 엄마의 자식, 가족으로서 너무 행복했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없는 생일은 처음이라 어색하네. 앞으로 매년 글 남길게. 보고 싶다.
92 notes
·
View notes
Text
25.12.23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이 많이 춥죠.
시린 공기를 맞으면 살이 쉽게 트고 시린 공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이마시면 폐가 따가워지는 그런 추위에요
감기 걸릴 게 걱정돼 소중한 사람들에게 일교차를 한 번 더 알려 주고 싶은 그런 추위.
피어나 여러분들은 따숩게 여미고 다니시죠?
홀리데이는 사람마다 의미가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설렘만 가득할 수 있으며
어떤 분들에겐 내리는 눈과 함께 우울함이 동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트리 밑에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들 사이에 화려하게 위장된 불안감도 찾아 온다고 할 수도 있죠.
한 챕터의 끝, 그 해의 기록들을 되돌아볼 마지막 체크포인트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점점 가까이 가닿을수록,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놀라운 인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간 참 빠르다“ 우린 흔히 말하죠. “뭘 했길래 벌써 연말이야?“
그러게. 난 그간 대체 무엇을 했던가.
나는 충분히 했을까?
나는 충분해졌을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의 모습과는 아직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을 깨닫는 것.
지난 일 년 동안, 여러분들은 극심한 상실감, 고통, 상심, 의심, 새로운 시작, 막��한 끝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온전히 잃고도 첫 땀 부터 차근차근 자신이라는 태피스트리를 다시 꿰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내면을 치유해 보시고,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과 연을 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을 수도
후퇴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현재의 당신들은 눈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는 그것을 극명히 상기시켜 줄 거예요.
하지만 전 당신이 성장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모든 일에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일이 일어나면 나타날 거고요. 그 순간 마음속에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맞게 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요.
하지만 바람은 항상 실제보다 더 춥게 체감하도록 만들죠.
살이 트고 폐가 따가울 수 있습니다.
트고 따갑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에요.
저도 트고 따갑습니다.
다만 이번 겨울에는 따뜻함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따뜻함이 저라면, 저를 품고 가주세요. 저의 가장 쌀쌀한 밤들에 여러분들이 제게 따뜻한 이불을 가져다주셨듯이.
이번 겨울, 가만히 서 있고 싶으시다면, 가만히 서 있으셔도 됩니다. 저도 옆에 서 있을게요.
눈이 내리고 쌓이고 녹아가는 풍경을 함께 보시죠
그렇게 봄은 더 빨리 오겠죠.
happier holidays
💌
hi everyone !
it is very cold out lately.
it’s the kind of cold that cracks my skin and stings my lungs when i inhale too deep all at once.
cold enough to make reminders of the weather to my loved ones, in case they go out and catch a cold.
i hope you all have worn warmly enough.
the holidays may feel different to everyone.
to some, it may simply mean pure joy and spirit.
for others, there may be a sense of sadness when it comes to the end of the year. the holiday season may be nothing more than existential anxiety wrapped in tinsel.
it’s the closing of a chapter — the final checkpoint to look back — and when we near that final page, we find ourselves facing an incredible awareness of the passage of time.
“time flies” we say. “what happened for it to already be the end of the year?“
good question. what have i done?
have i done enough?
have i become enough?
and how harrowing it is to be met by the realization that maybe i am nowhere near the version of myself i want to be.
in the past year, perhaps you have experienced crippling loss (or losses), pain, heartbreak, doubt, beginnings, endings. perhaps you have lost yourself, badly, and are still in the process of piecing yourself back together again.
perhaps you’ve chosen a new path, but are struggling to push forward. you have maybe done some healing, cut some people out of your life.
or maybe you’re still stuck. maybe you want to retreat.
whatever it is, you are not where you were the last time you saw snow. and the cold is a stark reminder of that.
but i can assure you you have grown.
you might not know it now, but in time, you will see that everything has happened for a reason. that reason will appear when everything has happened. you will feel it inside you. you may even already have the answer within you somewhere.
but right now, you are right where you need to be.
that is enough.
it is cold out, yes.
but the wind will always makes it feel colder than it actually is.
your skin may crack and your lungs may sting.
but you crack and you sting because you are alive.
i crack and i sting, too.
i only hope that this winter, you may also find warmth.
if that warmth is by chance me, i ask you to please hold me close. just like how on my coldest nights, you have brought me warmth, without you even knowing it.
if this winter you wish to stand still, you can stand still. i’ll be still right next to you.
and maybe we can watch the snow fall, drift, and melt together.
spring might come faster that way.
happier holidays
💌
21 notes
·
View notes
Text
B급 사진 일기
제목: 우당탕탕 혼자 또 동묘에 가다

볼 것 많고 너무 재밌어서 사진 찍을 틈도 없이 구경하기 바빴다.
3일 전 (동묘 시장 걷던 중에)
소: 김씨! 저기 저 골목에도 뭐 있는 것 같아. 맞아?
서: 아냐. 뭐 없어.
소: 진짜? 뭐 있을 것 같은데, 음식만 파는 곳인가?
서: 응응
소: 확실해? (뭐 있을 거 같은데...)
서: 맞아요! 내가 여길 몇번을 왔는데 ~!
김. 나 오늘 그 골목 다녀왔다. 볼 거 증말 많더라 ( ≖.≖)

그. 골목^^에서. 짱 좋아하는 프레셔스 모먼트 발견!!!
"사장님, 이거 얼마에요?"
"개당 3만원. 자수야 자수"
(😗😗😗)
"좀 비싸지? 개당 2만원만 줘."
"감사합니다 ~ 하나만 할게요!"
"근데 이것도 하고싶긴 한대..."
"그래, 두개 해. 같이 놔야 이뻐~"
"흠......🥺🥺🥺 만오천원에 안 돼요?🥺🥺🥺"
"아융 알았어~ 이거 다른대선 10만원 부르는 거야~"
"네🙂 감사해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래, 가져가서 맘에 안 들면 다시 가져 와 환불 해줄게~"
"(절레절레👋)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


😮💨: 야, 너는 들고 올 수 있을 만큼만 사야지
😃: 그만큼 샀잖아 양손 가득
😁: 어우 진짜 너는 뭐에 꽂히면 장난 아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피곤해
😃: 재밌잖아! 재밌잖아! 일상이 버라이어티하니 좋지?! 그리고 구하기 힘든템들만 샀어 !
🤥: ㅋ ㅋ 그래 잘했네 근데 너 미니멀리스트 아니야?

과탄산 소다랑 아이깨끗해 600ml 욕조에 풀고 이태리 때타올로 박박 밀었다. 옷은 비누 거품으로 세 네번을 빨고 헹궜다. 드라이기로 머리 곱게 말리고 빗���도 해줬다. 🫠

근데 집와서 찾아보니 7~80년대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인형들로 중고시장에선 20~30만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수요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거슨 발 수술하는 장면

다시 보기 위해 쓰는 일기 끝. 이 포스팅 몇년 뒤에 보면 무조건 재밌음.
5 notes
·
View notes
Text
The strange case of 「Hare Krishna」
I don't expect anyone to use a translator to read this, but I thought I'd post it just in case.
The genre of this fanfic is just romantic comedy. Not serious.


-----
야다바의 수장이자 드와르카의 왕, 비슈누의 현신인 크리슈나가 두문불출하기 시작했다!
드와르카 내에서나 암암리에 돌던 이 소문은 호사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더니 순식간에 인도 아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처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열흘 무렵이 지났을 때에는 이미 이 건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손에 꼽을 정도로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인 드와르카와 관련된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할 터였는데 당대에 살아있는 최고신의 현신이라는 그 크리슈나와 관련된 일이기까지 했으니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마도 그들 중 누군가는 걱정으로,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또 누군가는 악의적인 마음으로 말을 덧붙였을 터였으니, 그 결과 소문은 본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윤색되고야 말았다. 어딘가에서는 크리슈나가 만 명이 넘는 아내들과 노니느라 정신이 없어 국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어딘가에서는 그가 신의 진노를 사 얼굴이 몹시 추하게 변한 나머지 방 안에 틀어박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심지어는 그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마저 떠돌았다. 소문의 근원지였던 드와르카는 차라리 평화로운 편이었으나ㅡ대부분의 야다바족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또 어린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떠도는가보다 생각했다��드와르카의 적국과 우방국을 불문하고 머나먼 곳에 자리한 나라들은 혼란스럽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것은 하스티나푸라와 인드라프라스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인드라프라스타 왕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소문이 처음 들려온 날 궁전이 통째로 뒤집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왕인 유디스티라의 경우 어쩌면 그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휘청이며 혼절할 뻔한 것을 그 뒤에 서 있던 비마가 잡아주어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다른 형제들이나 왕대비 쿤티 또한 대경실색하기로는 별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여장을 꾸려 다같이 드와르카로 향할 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온갖 약재에 마차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을 무렵이었다. 유디스티라가 막 마차에 몸을 실으려던 찰나 드와르카로부터 급히 사신이 도착해 크리슈나의 전언을 일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크리슈나 자신은 이와 같은 헛소문이 퍼진 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종식시키고자 오늘 드와르카 국민들 앞에 섰으니 곧 이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방국들은 괜한 걱정을 내려놓아도 좋다는 말이 그 뒤를 이었다. 사신의 전언을 듣고 유디스티라는 긴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들 형제들은 겨우 마주보며 미소를 짓곤 왕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끝내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던 유디스티라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우이자 크리슈나의 영원한 벗인 아르주나에게 그를 만나뵙고 무사를 확인하고 오라고 명을 내렸다. 아르주나 역시 크리슈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터라 곧바로 명을 받아들이고 단신으로 드와르카로 떠났다. 그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다.
쉬지 않고 제 애마를 보챈 덕에 아르주나는 예상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드와르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드와르카의 성벽은 언제나처럼 웅장했지만 그 앞을 지키는 보초들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도 삼엄한 것 같았다. 그들은 성문 앞에 늘어선 외지인들을 경계 어린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아르주나의 얼굴을 보고는 화색을 지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슬쩍 한 손으로 아르주나를 가까이 불렀다. 아르주나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자 그들이 애써 목소리를 낮추곤 말했다.
“아르주나 님! 아르주나 님이 맞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친우 크리슈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드와르카는 평안합니까?”
“말도 마십시오. 요 근래 퍼진 소문 덕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드와르카 내부야 그나마 괜찮았는데, 외지인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는……. 그래도 얼마 전 크리슈나 님께서 군중들 앞에 모습을 보인 뒤로는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크리슈나��� 괜찮던가요?”
“예에. 얼굴색도 좋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영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다른 분들도 잘 만나주지 않으신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르주나 님께서 와주셨으니 걱정을 덜었습니다. 분명 아르주나 님이라면 만나주실 테니까요. 부디 그 분께서 안녕하신지 확인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그걸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을요. 무슨 일이 있든 해결해내겠습니다.”
아르주나의 단언에 보초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인드라프라스타에서 왕족이 찾아오셨다!” 하고 외치고는 곧장 아르주나를 드와르카 성채 내부로 들여보냈다. 아르주나는 살짝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하고는 성 안으로 들어섰다. 서둘러 드와르카 왕궁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랐다. 크리슈나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얼마 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으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계속 두문불출하고 타인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걸까? 그런 모습은 크리슈나 답지 않았다. 크리슈나에게는 왕족답지 않게 자유로운 구석이 있었다. 그는 자주 제 형인 발라라마나 다른 의원들의 눈을 피해 저와 함께 왕궁을 빠져나와 시장을 걷거나 숲에서 노닐곤 했다. 본래라면 군중들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모습을 보이기보다도 아무렇잖게 시장을 걸어다니며 인사하거나 식사를 때우고 피리를 연주했을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긴 한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체 어떤 문제란 말인가? 대체 무엇이 비슈누의 화신인 그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동안 아르주나는 드와르카 왕궁 앞에 도착했다. 아르주나가 드와르카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발라라마와 수바드라가 왕궁의 정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여느 때와 달리 얼굴에 묘한 근심이 묻어나는 것도 같았다. 그런 와중에도 수바드라는 살짝 얼굴을 붉히고는 고개를 숙여 아르주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르주나는 눈치채지 못한 듯 곧바로 발라라마 쪽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발라라마 님, 수바드라 님. 저의 벗 크리슈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어서 와라, 아르주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구나. 일단 따라오도록 해라. 크리슈나의 방으로 안내해주마.”
크리슈나의 방이라면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아르주나는 구태여 그들의 친절을 거절하지 않았다. 아르주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발라라마가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수바드라도 아르주나의 뒤에서 따라왔다. 언제 보더라도 익숙해지지 않는 웅장한 왕궁의 내부가 아르주나를 반겨주듯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났다. 아르주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크리슈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라면 있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요?”
“큰일이라면 큰일이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할까.”
뜬구름만 잡는 소리에 아르주나의 미간이 살짝 좁혀들어갔다.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발라라마는 크리슈나와 마찬가지로 쉬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법이 없었다. 아르주나는 ���라라마에게서 무언가를 캐묻기를 포기하고 제 뒷쪽의 수바드라를 바라보았다. 수바드라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면서도 아무 말도 잇지 않고 다시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수바드라를 괴롭히지 마라. 그 애는 너만큼이나 알고 있는 게 없으니.”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농이다. 도착했구나.”
그 말대로였다. 발라라마가 걸음을 멈춘 곳 앞에는 익숙해 마지 않은 크리슈나의 방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르주나는 당장이라도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만 했다. 아르주나 쪽을 잠시 바라보던 발라라마가 성큼 발걸음을 옮기곤 크리슈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지? 방 안쪽에서 낮으면서도 청아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리슈나였다. 나다, 크리슈나. 아르주나와 수바드라도 함께 있다. 발라라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크리슈나가 말했다. 아르주나? 아르주나가 살짝 입을 열었다가 발라라마 쪽을 곁눈질했다. 발라라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대답했다.
“예, 접니다. 크리슈나.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파르타? 정말 파르타니?”
“예. 그렇고 말고요. 크리슈나. 당신의 파르타입니다.”
“파르타…….”
크리슈나의 한숨 같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잠시 침묵이 자리했다. 아르주나는 조바심이 나 손을 꼼지락거리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고야 말았다.
“케샤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당신의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당신이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당신을 만나야만 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아요.”
“파르타.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너를 들여보내기엔…….”
“제발요, 케샤브. 저를 내칠 셈인가요?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다면 저도 함께하면 될 것이고, 세상 무엇보다 추해져있다 할지라도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의 당신이든 제게서 당신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파르타…….”
어느새 크리슈나는 문 바로 앞까지 다가온 듯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발라라마는 질린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르주나와 문 쪽을 흘겨보았다. 케샤브……♡. 파르타……♡. 두 사람은 이미 저들만의 세상에 빠진 지 오래였다. 그리고 수바드라는…… 제 작은 오라비를 질투해야 좋을지, 아니면 그 덕에 아르주나와 잠시나마 함께 있을 수 있단 사실에 감사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가엾은 수바드라. 발라라마는 지끈거리는 기분을 느끼며 두 손가락으로 미간을 짚었다.
“알겠어. 그럼 아르주나만 들여보내고, 형과 수바드라는 돌아가. 아르주나나 내가 나가거나 누군가를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고.”
“알겠다. 그럼 우린 이만 가자, 수바드라.”
“네, 네에. 그럼 안녕히, 아르주나 님…….”
수바드라는 발라라마에 이끌려 반대편 복도로 떠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지 연신 뒤쪽을 돌아보았다. 아르주나는 그녀가 돌아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아주었다. 그러기를 한참, 마침내 수바드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만나러 왔다고 했으면서, 수바드라가 마음에 든 거니?”
살짝 토라진 것도 같은 목소리였다. 아르주나는 놀라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도 잊은 채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럴리가요, 크리슈나. 여성분께는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당신도…….”
“농담이야. 파르타. 너는 정말이지 놀리는 재미가 있구나.”
“크리슈나!”
“그래서, 들어오지 않을 거니? 너를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이야.”
“아, 물론……저어,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응, 뭐, 준비는 다 해두었으니까.”
준비? 아르주나가 의아하게 여기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리곤 커다란 손이 그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쿵.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방의 문이 닫혔다. 아르주나는 어안이 벙벙해져서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다가 제 눈앞의 인영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완연한 청년의 모습이면서도 마치 소년처럼 개구지게 웃는 모습은 결코 다른 누구와 헷갈릴 수가 없었다. 제 오랜 벗이자 최고의 스승인 크리슈나였다. 그는 보초병에게 들었다시피 안색이 나쁘기는 커녕 언제나와 같은 생기로 넘치고 있었다. 어딘가 다친 것 같지도 않고, 소문처럼 추해지지도 않았고, 그냥 그는……크리슈나였다.
“크리슈나!”
“오랜만이구나, 아르주나. 정말이지 보고싶었단다. 어디, 간만에 한 번 안아볼까?”
“와앗, 크리슈나, 잠깐만요.”
크리슈나가 몇 번이나 끌어안고 몸을 들어올리려 하는 통에 아르주나는 몇 번이나 휘청여야만 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모습에 아르주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크리슈나도 참. 저를 늘 어린애 대하듯이 한다니까요. 나이 차이가 그리 나지도 않으면서…….”
“뭐, 어쩌겠니. 네가 이해하렴. 화신이란 변덕스러운 존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아르주나가 멋쩍게 꼼지락거리자 크리슈나는 쿡쿡 소리내어 웃었다. 눈앞에 보이는 크리슈나는 정말로 즐거워 보였고, 또, 괜찮아보였다. 무언가가 살짝 어색해보이는 것도 같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아르주나는 가만히 크리슈나 쪽을 바라보았다. 크리슈나도 아르주나의 시선을 느낀 듯 제 벗을 마주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아르주나?”
“아뇨, 괜찮아 보이시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째서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걸까, 하고.”
“때로는 허황된 소문이 돌기도 하는 법이지. 왕이라는 직책도 참 피곤하지. 잠시 방 안에서 피리 연주에 몰두할 새도 없다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방에서 피리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크리슈나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본인도 말했듯이 그에게는 영 변덕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뭘까. 이 묘한 어색함은. 뭔가 초조해보이는 것도 같고, 뭔가 평소와는 다른 것도 같은…….
“크리슈나.”
“응?”“그 기다란 관은 뭔가요?”
“뭐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이지.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쓰는. 너도 유디스티라를 수행하니 알고 있을 것 아니니?”
“네. 알고 있지만, 당신이 제 앞에서 그런 관을 쓰는 일은 드물지 않나 싶어서요. 왕관은 불편하다며, 늘 공작깃 하나만 꽂고 계셨는데…….”
“…….”
“크리슈나?”
그때 크리슈나��� 왕관 위로 무언가가 움찔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크리슈나의 머리칼과 같은 검은색의 무언가였는데, 아르주나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 더욱 격하게 쫑긋……쫑긋? 부드러운 털 같은 무언가가 크리슈나의 왕관 너머로…….
“와, 와아아,”
“아르주나, 쉿.”
크리슈나가 성큼 다가와 아르주나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난처해보였고, 그의 눈이 도르르 굴러가는 것에 맞춰 왕관 위의 털뭉치도 쫑긋쫑긋 움직이고 있었다. 크리슈나의 손에 틀어막힌 아르주나의 입이 몇 번이나 우물거리자 크리슈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소리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겠니?” 하고 속삭였다. 아르주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크리슈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떼어냈다.
“……크리슈나?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게……말하자면 복잡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얼마가 걸리든 괜찮아요.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관에 있는 건…….”
크리슈나가 다시금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관을 벗었다. 그러자 조금 전에 보았던 검은 색의 털에 휩싸인 무언가가 축 내려앉았다. 크리슈나는 민망한 듯 관을 짚고 있던 두 손으로 그것을 가리듯 붙잡았다. 그 손틈 사이로 보이는 그것은 마치……동물의 귀를 닮아 있었다.
“귀……인가요?”
“응. 아마도 토끼의 귀일 거라고 생각해.”
“토끼인가요. 어째서? 저주 같은 건가요?”
“저주라고 할까. 일종의 만트라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뭐, 간단히 말하자면 나를 찬양하는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먼 미래의 언어, 먼 미래의 일이 지금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아무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무언가 충돌돼서 생긴 문제니까 아마 몇 주 정도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보이기 민망한 정도의 문제일 뿐이니까……. 아르주나?”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말이 이어지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크리슈나의 관이 있던 곳, 그러니까, 지금은 쫑긋거리는 토끼의 귀가 자리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축 처져만 있던 귀는 크리슈나가 말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쫑긋거리고 있었는데 아르주나는 홀린 듯 그것을 보고 있었다. 올려다보는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고양이마냥 초롱초롱했다. 크리슈나는 잠시 아르주나를 보더니 큰 소리가 나게 박수를 쳤다. 그러자 놀란 아르주나가 튀어오르듯 몸을 움찔 떨었다.
“죄, 죄송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실례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신기한 일은 맞으니까. 그냥……보기 좀 그렇지?”
“아뇨, 그럴리가요. 그러니까. 저어.”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의아하단 듯 고개를 기울이자 이번에는 아르주나의 눈이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하고 떠돌았다. 힐끔 크리슈나를 쳐다보아도 말을 돌릴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한참을 어물거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가, 감히……귀엽다고……생각했습니다.”
아르주나의 작은 목소리를 기어이 잡아챈 크리슈나가 잠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였다. 고개를 숙인 아르주나는 이제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몇 초가 지나서야 크리슈나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고, 거의 동시에 두 귀가 쫑긋 솟아올랐다. 거의 파닥거리듯이 귀가 움직일 정도였지만 얼굴을 가린 아르주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르주나, 하고 제게 말을 걸어오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뿐이었다.
“아르주나.”
“죄, 죄송합니다. 크리슈나. 그러니까 전…….”
“으응, 아니, 괜찮아. 자. 아르주나. 손 떼고, 내 얼굴 좀 보련?”
“제가 감히…….”
“괜찮다니까.“
우물쭈물거리던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채근에 못 이기고 얼굴을 가리던 손을 치웠다. 조심히 고개를 들어올리자 만면에 미소를 지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는 크리슈나의 모습이 보였다. 황급히 다시 눈을 내리깔자 크리슈나가 양 손으로 아르주나의 뺨을 잡고는 제 쪽으로 눈을 맞추도록 했다.
“아르주나.”
“예, 크리슈나.”
“내가 귀엽니?”
“…….”
“드와르카의 왕이자 비슈누의 화신에게 귀엽다니. 이것 참, 이런 불경한 말을 꺼낸 자를 어찌 해야 좋을까. 삼대를 멸해야 할까, 그 친족들에게 전부 벌을 내려야할까?”
“죄, 죄송합니다. 크리슈나. 이건 오로지 저만의…….”
“이제야 눈을 맞춰주는구나.”
아르주나가 입을 다물었다. 크리슈나는 무엇보다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농담이란다. 내가 네게 그럴 리가 있겠니? 아무리 내가 변덕이 심한들 네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니. 아아, 정말. 하지만 놀랐어. 네가 괴물 보듯이 할까봐 걱정했는데, 귀엽다는 소리를 들을 줄은 아무리 나라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는 당신이야말로……제가 당신을 괴물 보듯이 할 리가 없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겠니?”
이제 아르주나의 얼굴은 어두운 피부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크리슈나는 조금 전까지 보였던 초조함이라곤 온데간데 없이 사랑스럽다는 듯 아르주나를 내려다보았다. 아, 저 눈. 크리슈나는 늘 이랬다. 언제나 아무렇잖게 사랑을 입에 담고, 애정이 담뿍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다. 차라리 그것이 농에 불과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장 너무한 점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며 과장 하나 없는 진짜배기라는 것이었다. 아르주나는 가끔씩 그가 건네는 무거운 감정에 질식할 것만 같은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거대한 밤하늘이 오로지 저만을 바라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아르주나는 애써 홱 고개를 돌리고는 말했다.
“친구로서, 그리고 유디스티라 왕의 전령으로서 당신이 무사하시단 것을 확인해서 기쁩니다. 크리슈나. 이제 명을 수행했으니 저는 왕께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누구 마음대로?”
“네?”
“원, 아르주나.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낼 리가 없잖니.”
크리슈나는 그리 말하면서 아르주나를 슬금슬금 뒤쪽으로 몰아갔다. 연신 뒷걸음질치던 그가 다리에 무언가 닿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뒤쪽으로 쓰러져 푹신한 것에 몸이 파묻힌 다음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드와르카에서 가장 호화로운 방의 가장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었다.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을 때는 늦은 지 오래였다. 크리슈나가 그를 가두듯 몸을 교차하며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가까웠다. 당장이라도 닿을 것만 같은 낯에 두근, 두근, 소리내어 심장이 뛰었다. 크리슈나가 눈을 휘어접듯이 웃으며 말을 건넸다.
“있지, 아르주나. 내가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는 아르주나의 드러난 살갗을 서늘한 손으로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것도 간만인데, 침대 사정도 모르면 내가 많이 아쉬울 것 같거든. 내 욕심에 어울려주지 않겠니?”
아르주나는 입을 몇 번이나 벙긋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뒤를 이었고, 크리슈나는 언제나와 같이 그의 목소리를 잡아챘다. 그는 무엇보다도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 사촌이자 친우이며 제자에게 입맞췄다. 긴 입맞춤이 뒤따랐고, 침대의 가림막이 그들의 모습을 가렸다.
아마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은 행복할 것이었다.
……아마도.
7 notes
·
View notes
Photo

골프는 역시 멘탈 스포츠
예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력 없는 사람들이 멘탈 핑계를 댄다고 속으로 생각하곤 했어요.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another level의 말씀이니 예~ 물론 그렇겠죠~ 하겠지만요.
그런데 멘탈 스포츠가 맞다는 생각도 들게 됐는데요. 골프가 아무리 나 혼자만 잘 치면 되는 운동이긴 하지만 동반 플레이어가 있다보니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특정인에게 징크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호구 잡힌다”라는 표현을 쓰던가요? 보통 땐 잘 하다가도 어떤 사람만 만나면 평소 플레이를 못하고 맥을 �� 추는 경우.. 프로 고수들의 바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곤 하단 얘긴 들은 것 같아요. 탑클래스의 고수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기는 특정인을 만나면 발목을 잡히곤 한다고..
저는 요즘 백사장님이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물론 기본 실력도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제 플레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곤 해서 더 큰 차이가 나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마음 같아서는 지난 번에 얘기했던 첫만남에서의 스팽킹 치욕을 멋지게 갚아버리고 싶었지만.. 그 뒤 몇 번의 대결에서도 제대로 이겨보기는 커녕 언제나 그가 맘만 먹으면 가지고 놀 수 있는 호구같은 존재가 되버렸어요. ㅠ
첫 대결의 상처도 채 가시지 않은 이틀 후인가 사부님에게서 예정에 없던 평일 스크린 게임 가능하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백사장이 저랑 또 게임하고 싶어한다고.. 이젠 볼기때리기 같은 벌칙은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키셨구요. 저도 저녁시간이면 다른 방에도 사람들이 있을테니 심하게는 못할 거란 생각도 있었고.. 내심 첫 만남에서의 모욕을 갚아주겠다는 오기도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찾아가니 백사장님은 연습장 모드로 드라이버를 풀스윙으로 날리고 있었고 저는 잠시 갤러리 모드로 스윙을 분석해 봤어요. 지난번엔 바로 게임에 들어가서 스윙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 구력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스윙이더군요. 야구선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왼쪽 다리를 살짝 들면서 템포를 맞추는 것이 다소 정석은 아닌듯 하단 느낌이었고요.
저를 보더니 지난번 벌받은데는 괜찮냐고 묻길래 애써 덤덤하게 괜찮다고 했어요. 실은 그날 돌아와서 반신욕 하면서도 얻어맞던 순간이 자꾸 떠오르고 부은 엉덩이에서 전해오는 열감만큼이나 간만에 느끼는 수치의 쾌락도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걸 얘기할만한 관계가 아니었죠.
그렇게 이기고 싶다는 승부욕과 또다시 모욕 당하고 싶다는 피학의 욕구가 뒤섞인 채 두번째 승부에 들어갔어요. 코스는 제가 고르기로 해서 떼제베CC를 골랐는데요. 플레이 다 하고보니 백티와 챔피언티 거리가 같고, 프론트티와 평균 20미터 차이밖에 나지 않아 저에게 메리트가 없는 코스더군요.
사부님은 이제 볼기 때리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금지라고 하셨고 페널티는 홀별 매치플레이로 왕게임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프면 배판으로 이긴 사람이 두가지 명령하는 걸로 했고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머리속에는 과거의 벌칙받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죠. 기대감과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이 정신을 어지럽혔어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거의 모르는 사람과 어떤 벌칙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스크린은 다 아는 사람들.. 특히 예전 주인님들은 저보다 하수들인데 제가 한수 접어주기위해 핸디캡 개념으로 안고 간 거였기에 지금처럼 실력으로 꺾이며 당하는 벌칙보단 수치심이 적었죠. 그냥 성적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골프라는 수단이 동원됐던거고.. 지금은 골프라는 승부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페널티라는 차이.
이날은 하얀 미니스커트에 하얀 티팬티, 스포츠 브라에 연한 핑크색 면티를 입고 있었어요. 첫 홀은 파로 하프였던 거 같고 두번째 홀에서 백사장님이 버디를 해서 배판 적용 왕게임 지시 2개였는데요. 하나는 버디 기념으로 골프존 유현주 프로 캐디 제스쳐랑 멘트 하라는거.. 다른 하나는 걸그룹 댄스 아무거나 해보라고.. 댄스는 할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럼 곤란한데.. 라면서 오늘 춤 좀 많이 시켜볼랬는데 안 출 거면 몸에 있는 거 하나씩 벗으라고 하네요. 억지로 춤을 추면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저도 옷 벗는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울 것 같아 벗는 쪽을 차라리 택했어요. 성적 수치심이야 저도 즐길 수 있는 쾌락이지만 분위기 어색해져서 웃기지도 즐겁지도 않은 뻘쭘한 상황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리 묶었던 밴드부터 뺐어요. 계속 벗기려고 하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몇 게임 지면 지킬 수 있는게 없겠더군요. 살살해 달라고 부탁했죠.
저녁 시간이어서 다른 룸에도 예약이 다 찬듯 매장이 부산했고 사부님도 나가서 안내하고 세팅해 주고 일을 봐야 했어요. 룸에는 이제 백사장님과 둘이서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백사장은 게임 중간중간에 ㅇ프로님(사부님)이 그러는데 혜연씨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독특한 여자라고 들었다면서 직업이 뭔지 사는데가 어딘지 골프는 왜 열심히 치는지 사적인 부분들도 묻곤 했어요. 저는 첨에 순순히 대답해 주다가 질문에 답해주는 것도 페널티로 하겠다고 했죠. 좀 약이 오른 듯 한 표정이 되더니 이를 꽉 물고 드라이버를 더 멀리 보내더군요 ㅎㅎ
전반까지는 머리밴드, 브라, 팬티 벗는 것 까지로 페널티를 방어했는데요. 첨에 질문에 순순히 대답했던 거만 아니었어도 더 지킬 수 있었을 거에요. 장갑도 두쪽 다 끼고 있었으면 오른쪽은 페널티로 내놨을텐데 원래 왼손만 끼고 치는지라.. 신발이나 양말도 벗으면 제대로 샷이 안되니 샷에 지장되지 않을 것들은 다 페널티로 내놨죠. 구석방에서 치고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들여다 볼수 있기에 더이상 벗는 것은 서로 부담스러웠고요.
후반엔 제가 지면 다음 홀 티샷 셋업때 스커트 뒷자락을 허리에 올려 맨엉덩이를 드러내고 치면서 클럽 그립 부분으로 보지를 건드린 후 셋업하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손을 대지는 않기로 했으니 ��으로라도 즐기자는 마음이었겠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게임에 임했고, 더한 경험도 스크린에서 많이 당해봤기에 두번째 본 남자랑 단둘이 치면서 노출�� 감행해도 예상보다 담담하게 칠수 있었어요. 백사장님 차례가 되서 화면을 보고 있을 때는 눈치 못 채게 티슈로 흘러내리는 애액을 닦아내서 휴지통에 버렸고요. 허벅지로 줄줄 흘러 내리는 애액을 보이는 건 아직 아닌 듯 해서요.
수치플에 적응이 되서 마음이 안정이 되니 제 샷도 부드럽게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가 세컨샷 정확도가 높아져 이기지는 못해도 비기는 홀은 많아졌어요. 그 와중에 지는 홀이 생기면 다음 홀 공 세팅할 때 한쪽 다리 들고 공을 짚거나 백사장님 쪽으로 엉덩이를 보이고 허리를 굽혀 공을 세팅하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앉아있다가는 애액이 그대로 스커트에 배어버릴 듯 해서 후반전에는 뒤에 서 있었는데 결국 허리굽혀 뒤를 보여주는 동안 온통 젖어버린 다리 사이를 숨길수 없었습니다. 백사장님은 굳이 모른 척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혜연씨 물이 엄청 많은데 좀 닦아드릴까 했는데 전 괜찮다고 했죠.
제가 첫 게임처럼 속절없이 무너졌으면 어떤 벌칙까지 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두번째 게임은 다시 패배하긴 했지만 그나마 선방했고 조금은 가능성도 보이는 경기였어요.
물론 이건 두번째 경기때 생각했던 감정이었고…. 이후 경기에선 거의 대부분 일방적으로 그의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오늘은 요기까지~
** 텀블의 방해공작이 심해 올리기 힘드네요~~ ㅠㅠ
230201 혜연
120 notes
·
View notes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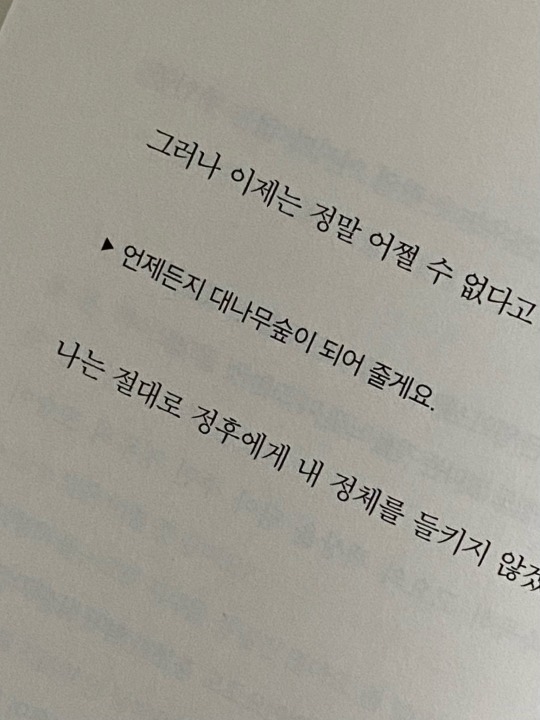

본가로 돌아오기 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다. 그쯤의 나는 이제 막 말투에서 촌년 티를 벗어 낸 후였고 특별히 단짝이라고 할 만한 친구 없이 지내다 생애 처음으로 소중하다고 할만한 무리가 생길랑 말랑하고 있었더랬다. 이모는 항상 특기 적성으로 성적에 필요한 수업만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때는 무슨 바람이셨는지 내가 줄곧 배우고 싶다던 종이접기를 선뜻 신청해 주셨다.
꿈에 그리던 종이접기 수업에서 나는 다양한 학년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다 한 언니와 몇 번 같이 앉으며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다.
나는 그 언니가 좋았다. 어디서든 첫째이자 맞이인 나에게 두 살 터울의 그녀는 귀한 인연이었고 매사 우물쭈물하고 소심한 나에 비해 언제나 털털한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제일 좋아하는 수업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과 함께 배우는 이야기는 그 당시의 나를 여러모로 들뜨게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언니는 나와 함께 앉지 않았다. 내가 인사를 하면, 그냥 한 번 쓱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기 일쑤였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저 사정이 있으려니. 애써 올라오는 불안을 잠재우며 외면했다.
사실 어떤 일이 나려면 언니와의 사이어야 했다. 그런데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적성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던 참이었다.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내 옆을 지나며 욕을 하는 것이었다. 순간 깜짝 놀라 토끼 눈으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는데 처음 본 여자애가 본인의 친구와 함께 나를 보며 키득거리는 것이었다.
태어나 처음 겪는 일에 나는 너무 놀랐고 그렇게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얼마 뒤 알게 된 것은, 나에게 욕을 한 아이가 나와 같은 특기 적성을 듣는 동갑내기고 언니가 나를 무시할 무렵부터 함께 다니는 사이라는 거였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에게 욕을 한 이유에는 언니의 터무니없는 이간질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 이 일이 있기 전 나는 그 아이가 같은 수업을 듣는지도 심지어 같은 나이인지조차 몰랐다.
그러니 이간질이라는 말 자체도 본래라면 성립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그 아이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이 소식을 접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저 억울함이었다.
그제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싫어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다른 이의 미움을 사야 한다니.
그러나 누가 봐도 내 잘못이 아닌 이 일을 나는 바로 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해 겨울, 나는 반 친구들과 인사할 틈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요즘도 가끔 관계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면 자연스레 이 일에 대해 떠올리곤 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며 문득 그때 내 행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봐야겠다는 의문이 들었다.
만약 그때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이후에 그 아이는 나에 대한 오해를 풀었을까? 그리고 언니와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되었을까?글쎄.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관계는 더 악화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내가 벌이지도 않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내게 묻은 오해를 닦아내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비겁함 뒤에 숨어서. 내가 아닌 나의 행동을 그저 방치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른으로 자랐다.
나는 여전히 비겁하다. 소심하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비치지 않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나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는다. 어떠한 계기가 필요했던 걸까 생각해 봤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지나온 기회는 많았다. 그저 그때마다 용기 없는 나에게 스스로를 가둬두고 변하지 않았을 뿐.
그렇게 어느 면에선 무책임하리만치 스스로를 내버려둔 나를 책 속의 그녀는 일깨워 주었다. 너무나 유약하고 선하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하게. 그녀는 말미에 자신이 한 선택이 또 한 번 틀릴지라도 그 순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말한다.어쩌면 나는,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내는 아주 작은 용기를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내세울 수 있는 신념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그 연약한 단단함이 설사 지금보다 관계가 악화될지 언정 바로잡을 시도 정도는 해야 한다는.
나는 그녀에게서 그런 완고함을 배웠다.
잘 만든 이야기는 마음에 결이 인다.
책을 읽으며 그녀와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하다가 내가 그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평범은 생각보다 어렵고 다정은 그 무엇보다 강한 무기가 되니까.
11 notes
·
View notes
Text
우리의 전 생애는 꿈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생애의 잠을 잔다. 우리는 운명의 영원한 아이다.
불안의 서 | 페르난두 페소아, 배수아 저
6 notes
·
View notes
Text
어린 시절 존이 코르도나에서 발견했다고 기억하는 공룡 뼈. 언젠가 셜록이 수첩에 남겨 두었던 자그마한 실마리를 가지고, 짧은 휴식 삼아 절친과 추억 탐방에 나선다.

시작점은 광부의 말로 해안가, 하버 대로 서쪽 '시저의 다리' 밑. 스칼라디오에서 광부의 말로로 넘어갈 때 늘상 이용했던 길이라, 다리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다리까지 오기는 왔는데, 오두막은 어드메뇨? 스윽 둘러보니, 이쪽보다는 반대편에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 있을 듯하다. 일단 건너가 보자.

다리 건너 광부의 말로 입구에서 신문팔이 소년과 다시 조우. 얼마 전 셜록이 형님의 의뢰로 해결한 사건이 그새 신문사 레이더 망에 걸린 모양이다. 하긴, 그 편집장의 인맥과 셜록에게 보인 관심을 생각하면 이상할 일도 아니지. 그나저나, 코르도나 경찰은 정말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윽고 다리 부근에서 해안가로 향하는 나무 계단 발견. 분명 눈앞에 보이는 집들 중 하나에 옛 추억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얼마쯤 걸었을까.

정답. 짐작대로 몇 걸음 만에 새로운 위치 알림을 만날 수 있었다.
종종 그래 왔듯, 이번에도 존이 한 발 먼저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살피는 중. 그럼, 나도.

존과 공룡 뼈에 얽힌 옛 추억을 더듬어 가던 셜록은 당시 모험을 함께 했던 또 다른 친구를 떠올린다. 그 친구는 '토비'라는 이름의 개. 둘의 얘기를 듣자니 홈즈 가문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은 아니고, 코르도나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진 모양이다.
토비를 기억해 낸 셜록은 공룡 뼈에서 다시 새 친구와의 추억을 따라, 광부의 말로 서쪽 교회로 향한다.

교회 가는 길목에 동전 단서 추가 회수. 그간 틈틈이 찾는다고 했는데도, 단서조차 아직 발견 못한 동전이 꽤 많이 남았다. 1회차 때처럼 이번에도 몰아서 하느라 피곤하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신경 써서 부지런을 떨 걸 그랬나.
아무튼 형님이 쪽지에 적어 둔 내용대로, 동전을 찾기 위해 오래 전 그 용의자의 행적을 따라가 본다. 출발점은 코르도나 공동 묘지 남쪽 계단. 용의자는 당시 곳곳에 길을 막고 서 있던 형님의 수하를 피해 도망쳤다. 형님의 수하들이 차단한 도주 경로를 모두 제하면, 남는 가능성은…

모란 가에서 리퍼 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샛길. 여기서 용의자가 붙잡히는 광경을 집중 모드로 확인할 수 있���다. 동전도 분명 근처 어디쯤 감춰 있을 텐데. 용의자의 몸에서 난 생선 비린내와 손가락 상처가 아마도 실마리?

이거군. 설마 이런 데다 동전을 숨겨 놨을 줄이야. 생선 비린내가 났다길래, 생선 보관 창고나 저장통 안에 있으려나 했다. 어쩌면 이 담장 뒤가 범인이 잠깐 숨었던 생선 창고였다든가?

동전을 찾고 나면, 늘 그렇듯 셜록이 동전에 담긴 사연을 짧게 언급한다. 이렇게 1호 동전도 무사히 회수했고, 이어서 토비와의 추억이 잠들어 있을 교회를 찾아 보자.

어디쯤 왔을까, 화면 오른쪽 위에 꽂힌 빨간 눈 아이콘이 문득 눈에 들어온다. 쉬운 길 놔두고 괜히 또 시간 낭비할 뻔했군.
마침 길가에서 쉬고 있던 한 광부가 상냥하게 교회의 위치를 알려 준다. 그렇지, 고양이 애호가에게는 실패할 리 없지. 훗. 교회는 시장 골목 서쪽을 따라 내려오는 카펜터 가 인근에 있다.

어느 아침, 셜록과 존은 사이 나쁜 동네 일진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교회 근처의 마당으로 숨어든다. 숨은 보람도 없이 잡히려나 싶던 찰나, 구원 투수처럼 등장해 둘을 구한 것이 바로 토비. 토비의 사나운 기세에 눌려 일진 형은 혼비백산 도망치고, 토비는 그 일을 계기로 셜록과 존의 친구가 되었다. 이 견공, 사람 볼 줄 아네. 아니면, 셜록의 손에 들린 샌드위치의 힘이었을까?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뜻밖에도 셜록의 기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토비와의 첫 만남에 이어, 옥상에 수탑이 있는 건물을 떠올린 셜록. 셜록에 따르면, 교회에서도 그 건물이 보였다고 한다. 그곳에서도 토비와 무슨 일이 있었나?
수탑. 수탑이라…

혹시 눈앞의 저 건물인가? 꼭대기에 있어 낮은 곳에서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향은 대충 잡았으니까.
내려가서 찾아 보자.

수탑이 있던 낡은 건물. 어린 셜록은 그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진상을 알아보려 모험에 나섰다. 물론 여느 때처럼 존과 함께. 이번에는 코르도나에서 만난 새 친구 토비도 옆에 있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토비는 건물 앞에 멈춰 한 발짝도 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 셜록도 마음을 접었다면 좋았으련만…

알고 보니, 귀신 소동의 진짜 원인은 이곳을 근거지 삼아 암약 중이던 인신매매 집단이었다. 토비가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셜록과 존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금세 또 다른 범죄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남자들을 공격하는 토비. 남자들이 토비를 상대하느라 정신 못 차리는 동안, 셜록과 존은 무사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셜록은 토비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토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존은 토비가 몇 주씩 안 보일 때도 있지 않았냐며,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한다. 하지만, 존과 달리 셜록은 그때의 무모한 호기심이 자꾸만 후회스러운 모양이다.
그러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자꾸 되새겨 봐야 무슨 소용일까. 토비와의 인연이 끝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 개와 함께한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겠지.
평소와 달리 사뭇 진지한 말로 셜록을 타이르더니, 존은 셜록에게 그림을 그려 주겠다며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골라 봐라고 한다.

못된 애 겁주던 순간, 뼈를 찾던 순간, 노예 상인과 싸우던 순간. 두 순간은 토비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때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토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억이다.
셋 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오래 남길 거라면 순수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좋지 않을까.

존이 좋아하는 걸 보니 역시 괜찮은 선택이었군. 존이 그린 그림은 이후 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코르도나의 아이'라는 이름의 긴 추억 여행도 드디어 끝을 맺었다. 다음은 어디로 가 볼까.
…M?
5 notes
·
View notes
Text
10-Second Interview⏰Hyuk | @ realvixx
*translation under the cut
↠자켓 때 보여준 사진 중 가장 자신있는 포즈는? ↠What's the pose you're most confident in during the album cover?
전 딱히 포즈를 안 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요 -W- I didn't strike a pose Standing still. - W-
↠오늘 촬영 종료 후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What food do you want to eat the most after today's shooting?
떡볶이! Tteokbokki!
↠나의 매력은? 귀여움 VS 멋짐 ↠What's my charm? Cute vs cool
귀여움인가 봐요 I guess it's cuteness
↠ 귀여운 포즈 한번! ↠ Cute pose!
👉🙂
↠이번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 별빛들에게 10글자로 한 마디! ↠Please say a word to Starlight who is waiting for this album in 10 letters!
많이 기대해 주세요 파팅 Please look forward to it. Fighting
11 notes
·
View notes
Text

기상 시간이 앞당겨졌고, 일출 시간에는 집이 아니라 운전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날이 좋아도 해 뜨는 걸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해가 뜨기 전 풍경을 보게 되었다.
이번주부터 하우스허즈번드가 되면서 회사의 생활이 가족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느꼈는데, 요즘 그에 대해 생각 중이다. 그 깨달음의 이유가 내가 서 있는 자리, 바뀐 자리 때문이었다면,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답변은 다른 이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나만 유독 이기적인 것이다는 것이고, 다음은 회사를 다니면 누구나 그러하다는 것 쯤 아닐까. 그것이 가족회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셋째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더 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첫 번째 가설을 스스로 깨닫기란 쉽지 않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묶어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미뤄둔다. 그것보다는 바뀐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어제 많이 만들어놓은 잡채 덕분에(당면의 양을 많이 잡은 내 탓에) 저녁 반찬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이틀 연속 같은 밥을 먹인 건 미안하지만.) 그랬더니 책을 조금 읽을 시간은 되었다.
18 notes
·
View notes
Text
Follow your dream like breaker
니 꿈을 따라가 like breaker
Even if it breaks oh better
부서진대도 oh better
Follow your dream like breaker
니 꿈을 따라가 like breaker
Even if it falls apart, oh don’t run back, never
무너진대도 oh 뒤로 달아나지마 never
Because the dawn before the sun rises is the darkest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In the future, never forget who you are now
먼 훗날에 넌 지금의 널 절대로 잊지 마
Wherever you are right now, you're just taking a break
지금 니가 어디 서 있든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
Don't give up, you know
포기하지 마 알잖아
Don't go too far tomorrow
너무 멀어지진 마 tomorrow
6 notes
·
View notes
Text
들개
금요일 늦은 퇴근, 예사롭지 않은 날씨에 종종 걸어서 퇴근한다. 집으로 오는 길 근처 작지 않은 공원에 절이 하나 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그 절이 위치한 곳, 대로 건너편에는 시끄러운 야간 업소가 밀집해 있다. 금요일 밤이면 유난히 시끄러워질 때이다. 요란한 음악과 도로 위에 난폭한 자동차들이 내는 굉음을 등지고 귀가를 위해 그 절로 향했다. 목재로 된 계단과 데크를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올라가다가 누렇고 앙증맞은 귀여운 생명체를 목격했다. 작은 강아지가 풀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것을 뜯고 있다가 나를 멀뚱히 쳐다본다. 곧 도망가는 멍멍이, 알 수 없게 마음이 흥한 나는 조금이라도 동하면 그 생명체를 납치할 심정으로 온갖 괴상한 소리로 그 강아지를 유혹하며 다가갔다. 헌데 그 작은 생명체는 혼자가 아니라, 그것과 같은 작은 꼬물이 넷이 더 있고 그들을 지키는 제법 큰 멍멍이가 둘이나 있었다. 부모 개들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내가 걱정스러웠던지 잔뜩 경계를 하고 짖어댔다.
그 둘은 전에 공원에서 봤던 떠돌이 개였다. 그때는 큰 놈 넷이서 다니면서 마냥 피하고 다녔던 놈들인데 새끼들 때문에 변한 것 같다. 몇 주 전 주말에 숲 속을 수색하던 소방대원들이 생각났다. 어림짐작으로 아마 그 무리들을 잡으러 왔구나 싶었다. 이제 저 둘만 남았구나. 아니, 저 둘은 살아남았구나. 저 둘에서 다섯이 더해서 일곱이 되었구나. 걱정스럽게 짖어대던 일곱 가족은 가만히 서 있던 나를 위해 한쪽으로 피했다. 나는 그들이 비켜준 곳에서 멀어져 걸어갔다. 궂은 날씨에도 풀 뜯고 신나게 놀고 있었구나. 사람들의 불편함을 피해 스스로 살고 있구나. 그 큰 개 둘이 짖는 소리가 생각났다. 나를 잔뜩 경계하던 그 소리.
7 notes
·
View notes